<82> 변신의 이유

나는 누구인가. 살면서 다들 한 번쯤은 던져보았을 질문이다. 혹시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 아닐까. 인간이 늘 변하고 있다면, 차라리 이렇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무엇으로 변신할 것인가. 자기가 누군지 알고 싶은 욕망만큼 강렬한 것이, 자기 아닌 다른 존재가 되고 싶은 열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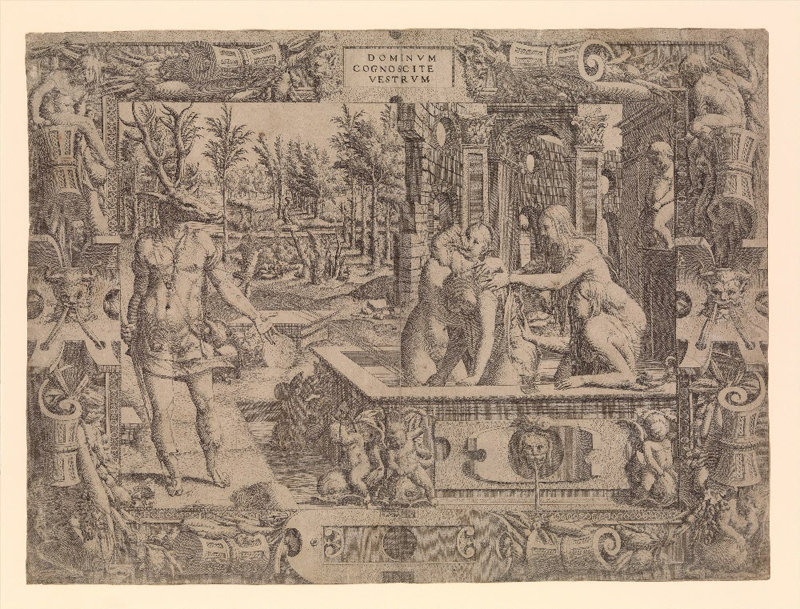
변신에 대해 유독 깊이 탐구한 한국의 예술가가 김범이다. 김범이 보기에, 인간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인간이 될 수 있다. 실로, 김범의 작품 세계 속에는 다양한 사물들이 인간이 되는 과정에 있다. 1995년 작 ‘임신한 망치’에서는 망치가 임신을 한다. 1994년 작 ‘기도하는 통닭’에서는 통닭이 기도를 한다. 2006년 작 ‘잠자는 통닭’에는 잘 익은 통닭 한 마리가 잠들어 있다.
김범의 작품 세계 속에서 인간 역시 다양한 사물로 변하는 과정에 있다. 그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작품이 아티스트북 ‘변신술’(1997년)이다. “이 책은 기존의 자연물과 인공물 가운데 기본적인 예가 될 수 있고, 응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골라, 필요에 따라 그것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한 지침서이다.” 그리하여 ‘변신술’은 인간이 나무가 되는 법, 문이 되는 법, 풀이 되는 법, 바위가 되는 법, 냇물이 되는 법, 사다리가 되는 법, 표범이 되는 법, 에어컨이 되는 법을 차분하게 안내한다. 이 다양한 리스트에 분명히 빠져 있는 것은 ‘신이 되는 법’이다. 신을 닮아가고자 한 인류 문명의 오랜 시간을 떠올릴 때, 이것은 의도적인 누락으로 보인다. 김범이 보기에, 인간의 변신은 그저 “주변 환경을 활용하여 생존율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에 불과하다. 변신은 변신일 뿐 초월이 아니다.
이 변신이라는 주제를 천착하게 되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좀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김범의 2007년 작 ‘10개의 움직이는 그림들’에는 풀 뜯는 기린에 대한 것이 있다. 여러 마리 기린이 나란히 서서 높이 달린 나뭇잎을 뜯어 먹는 장면이 먼저 나온다. 그런데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기린은 입이 나뭇잎에 닿지 않아 먹을 수 없다. 어쩌면 좋은가. 생물로 태어난 이상, 뭔가를 먹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나 모종의 원인으로 인해, 먹는 본능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 본능은 그냥 사라지는 것일까. 나뭇잎에 입이 닿지 않던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기린은 그냥 먹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 다음 장면을 보자. 나뭇잎이 높아 먹을 수 없었던 기린은, 표범이라는 육식동물로 변신한다. 그리하여 나뭇잎 대신 옆에 있는 기린을 잡아먹으려 든다.
김영민의 본다는 것은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
구독
-

여행스케치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어떤 ‘정치의 새’를 불러들일 것인가[김영민의 본다는 것은]](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05/05/124799314.2.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