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앙리 마티스는 42세가 되던 해 자신의 가족을 묘사한 ‘예술가의 가족’(1911년·사진)을 그렸다. 처음으로 한 화면 안에 온 가족을 등장시켰다. 가족들은 현란한 인테리어를 한 실내에 함께 있지만, 그다지 즐겁거나 화목해 보이지는 않는다. 화가는 왜 이런 모습을 그린 걸까? 그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림 속 배경은 그가 가족과 함께 살던 파리의 아파트다. 바닥에는 화려한 패턴의 양탄자가 깔려 있고, 벽난로 위 선반에는 꽃병과 조각상이 놓여 있다. 붉은 옷을 입은 두 아들은 체스를 두고 있고, 아내 아멜리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 중이다. 오른쪽에 서 있는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마르그리트다. 아멜리와 결혼 전 사귀던 여성에게서 낳은 딸이다. 이들은 한 공간에 있지만 각자 일에 몰두할 뿐 서로 어떤 교감도 없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심지어 엄마와 한 아이는 아예 눈을 감고 있다.
사실 마티스는 이 그림을 그릴 무렵 아내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두 사람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현실적인 공생관계였다. 가난한 화가였던 마티스는 어린 딸을 양육해주고 자신을 뒷바라지해 줄 아내가 필요했고, 아멜리는 모자 가게를 운영하며 남편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내조했다. 아내는 뮤즈이자 매니저 역할까지 자처하며 마티스의 경력에 깊숙이 관여했다. 그러나 마티스는 그런 아내에게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다.
이은화의 미술시간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변종국의 육해공談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소소칼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살아 있는 조각[이은화의 미술시간]〈319〉](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05/15/124947033.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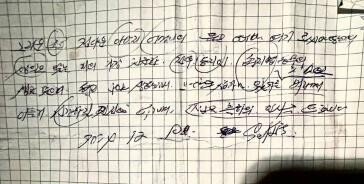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