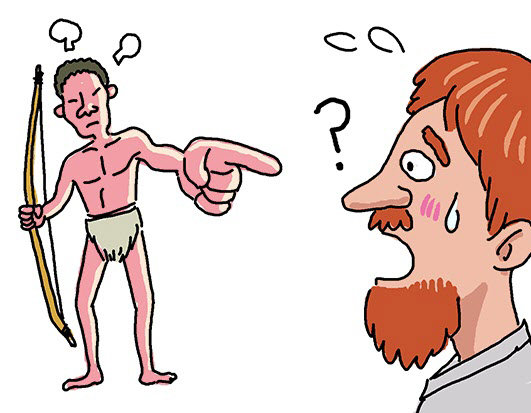
인류학자인 리처드 리가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의 부시먼들과 생활했을 때다. 그들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알려는 마음에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을 나누는 것도 삼가다 보니 구두쇠라는 평판이 생겼다. 먹을 게 귀해 무엇이든 같이 먹고 나눠 먹는 이들의 눈에 맛있는 통조림을 두 달 치씩 쌓아 놓고 살았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아니, 그렇게 늙고 말라빠진 황소를 고르다니∼.” “(고기가 부족해) 사람들이 싸우면 어쩔 거요?”
하지만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불안 가득한 그의 마음과 달리 사람들은 이틀 밤낮 동안 충분히 축제를 즐겼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에 사람들에게 물은 다음에야 그동안 몰랐던 그들의 문화를 알게 되었다. 큰일을 해낸 사람을 모욕하는 게 일종의 의무라는 걸 말이다. 아니, 좋은 일을 한 사람을 모욕하는 게 의무라니, 역시 미개한 사람들이었던 걸까? 주민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사냥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죠. 잘난 체하고 교만한 이런 사람을 그냥 둬서는 절대 안 돼요. 이런 교만이나 자만심이 언젠가 우리 중 누군가를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말이죠.”
고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조지프 A 테인터 미국 유타대 교수는 이 에피소드를 예로 들며 평등한 협력만이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에서는 자기 과시가 허용되지 않는 게 보통이라고 했는데, 우리 역시 귀담아들어야 할 말 같다. 이렇게 보면 젊은 세대들이 왜 꼰대라는 말을 ‘애용’하는지 짐작할 수도 있다.
서광원의 자연과 삶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의 운세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프리미엄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축복 또는 저주, 여섯 번째 손가락의 운명[서광원의 자연과 삶]〈92〉](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07/16/125967153.1.jpg)

![[사설]美 “관세 뒤 새 양자 무역협정”… 이젠 한미 FTA까지 흔드나](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226305.1.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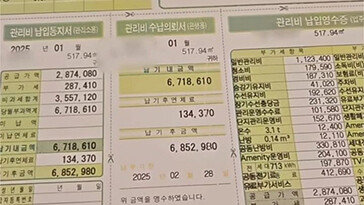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