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분으로 구성된 쌀로 해 먹는 밥이나 떡은 식으면 노화(老化·retrogradation)가 일어나 밥이 굳어지거나 떡은 딱딱해져 쉽게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려고 놋쇠 밥그릇에 퍼서 뚜껑을 덮어 이불 속에 넣어 두었다가 점심때 꺼내 먹었던 것이다. 떡은 아무 때나 먹을 수 없었고 설이나 잔칫날 해서 먹은 뒤 남겨 두면 역시 노화가 일어나 쉽게 먹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이를 다시 호화(糊化·부드러워지고 점성이 생김)시킨다고 물에 삶으면 수화(hydration)되어 풀어지고 엉켜 맛이 떨어졌다.
우리 조상들은 오랜 노력 끝에 나중에 떡을 먹어도 맛있게 먹을 방법을 발견해 냈다. 떡국과 떡볶이다. 가래떡을 썰어서 얇게 만들면 짧은 시간에 다시 호화시킬 수 있고 젤화도 방지하면서 간이나 멸치 양념을 쳐서 아주 맛있게 먹을 수도 있었다. 이런 지혜를 얻기 전까지는 떡은 설날만 만들어 먹는 것이었는데, 설날 며칠 전 가래떡을 만들어 떡이 노화되었어도 설날에 아주 맛있는 떡국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조상들은 나중에 떡을 맛있게 먹으려고 보통 절편과 가래떡을 만들어 광에다 보관하고 그때그때 꺼내어 먹었다. 겨울철 어머니들은 질쌈(길쌈)을 하고 아버지들은 가마니를 짜면서 두런두런 겨울밤을 보내고, 동네 어르신들은 사랑방에 모여 화로(爐)에 숯불을 갖다 놓고 둘러앉아 담뱃대를 꽂아 놓고 담배를 피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爐邊情談)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동지섣달 긴긴 겨울밤은 술시(戌時·오후 8시)만 되어도 속이 출출하기 시작한다. 이때 가장 많이 화롯불에 구어 먹었던 것이 고구마이고, 어머니가 숨겨둔 떡을 내어놓으시면 그만한 것이 없었다. 이때 만일 할머니가 설에 만들어 놓으신 조청(고구마 전분을 당화시켜 만든 전통적인 음식)까지 내어놓으신다면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맛있게 떡을 먹을 수 있었다. 떡을 화롯불에 구우면 구수한 냄새가 나고 다시 호화되어 먹을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 시대 제사나 시제를 드릴 때 이 구운 떡을 제사상에 올리기도 하는데, 이를 병자(餠炙·구운 떡, 떡볶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전통을 살리기 위해 쌀 떡볶이를 많이 만들고 있다. 떡볶이가 앞으로도 쭉 K푸드로서 인정받고 대표주자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권대영의 K푸드 인문학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딥다이브
구독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물고기 대신 걸려 ‘짐’ 된 해초… 펴서 말리니 ‘금’ 같은 김으로[권대영의 K푸드 인문학]](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07/11/12588445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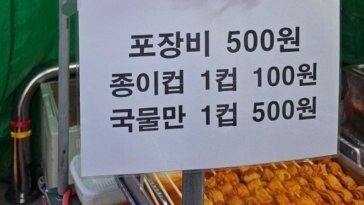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