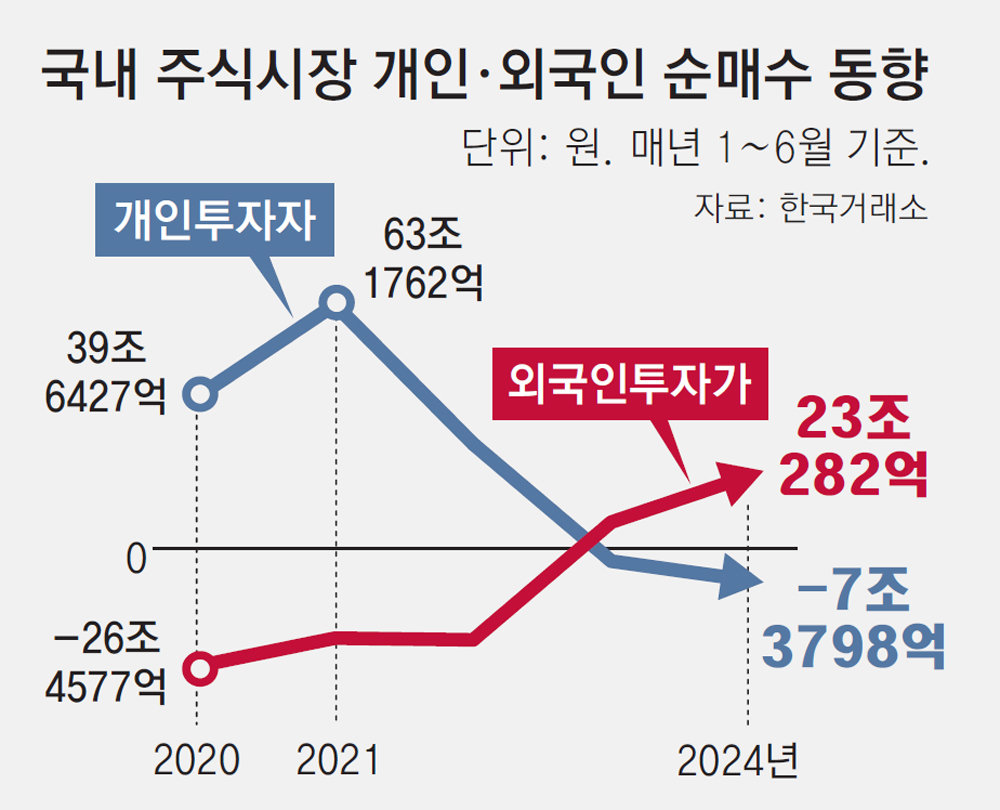
한국 자본시장이 양적으로 세계 상위권으로 성장했지만 효율성이나 투명성은 선진 시장에 비해 한참 뒤처진다는 외국인투자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자본시장연구원이 국내 증시에서 활동하는 해외 금융기관 15곳의 관계자 45명을 익명으로 인터뷰한 보고서에서다. 최근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된 가운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문제가 외국인들의 입을 통해 재차 확인됨 셈이다.
이번 인터뷰에서 한국 시장의 거래 규정이나 지침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홍콩·싱가포르 등 선진 시장은 물론이고 중국보다도 거래 지침의 투명성이 뒤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상 거래에 대한 기준이나 제재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융당국에서 내려오는 각종 구두지침, 행정지도, 모범규준처럼 명문화되지 않은 ‘그림자 규제’가 만연한 탓이 크다. 역대 정부마다 불합리한 숨은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수시로 소집해 압박하고, 금리 산정에 개입하는 등의 관치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두고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공매도가 주가 거품을 빼 적정 가격을 찾아주고 증시 유동성을 늘리는 순기능이 있는데도 왜 금지하는지,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되물었다. 외국인·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건 바람직하지만,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개미들의 표심을 의식해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퇴행적 조치를 더 연장한 영향이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사설
구독
-

월요 초대석
구독
-

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비전도 쇄신도 없이 ‘배신’과 ‘친윤’ 공방만 남은 與 당권 경쟁](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07/01/125719176.1.jpg)

![[사설]현직 대법관·판사 체포 모의… 군사정권도 안 한 사법부 유린](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702056.1.thumb.jpg)
![[정용관 칼럼]韓 대행은 ‘윤석열 대행’이 아닌 ‘대통령 대행’이다](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702059.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