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고 예뻐서 데려온 애가 남천이었어요. 어디서나 잘 자란다고 하고. 한동네 살다가 이사간 금천이라는 애도 생각나고. 그래서 잘 키워보고 싶었죠. 생각날 때마다 창문 열어주면서 물 주면서
그랬는데 시들해요.
일조량이 부족했을까요. 금천이가 중학생이 되어 놀러왔을 때 엄마 뒤로 숨던 일이 생각납니다. 동네에 그애가 있다 생각하면 신나면서도 그랬어요. 그런 날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가고
키우던 애가 커서
키우는 마음이 뭔지 아는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왜 자꾸 잊을까요. 얼른 가서 남천을 봐야겠어요.
―임승유(1973∼ )
무엇을 키우든, 누구를 키우든, 사랑해서 키우든 키우다가 사랑하든, 수많은 남천의 양육자들은 똑같은 마음이다. “잘 키워보고 싶었죠.” 시에 나오는 바로 그 마음. 맞다. 정말 잘 키우 싶었고, 잘 키우고 싶다. 키우는 것은 고단한 일이지만 때로는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아가, 엄마는 정말 그랬단다. 얘야, 너를 키우는 마음은 정말 그랬단다. 우리는 근심하고 노력하고 애타면서 널 키웠단다. 이 마음을 먹고 모든 이의 남천들이 잘 자라주면 좋겠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마음[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458〉](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07/19/126025875.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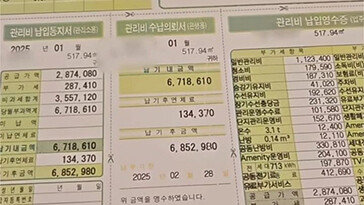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