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냥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독거 어르신 밑반찬 배달 및 말벗 봉사.’ 신청을 하긴 했는데 막상 가려니 때아닌 긴장감이 밀려왔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안내된 건물로 들어섰다. 10대 친구들이 무리를 지어 누가 누구랑 다퉈서 학원을 옮겼다는 이야기를 세상 심각한 얼굴로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 틈에는 자주 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내 또래 몇이 쭈뼛대는 나와 달리 익숙한 듯 무심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테이블에는 주소와 이름이 적힌 아이스박스 수십 개가 죽 늘어서 있었다. “처음 오셨어요?” 책임자로 보이는 이가 묻더니 대뜸 몇 개를 내 앞으로 배정했다. 활동의 배경이나 취지 같은 거창한 오리엔테이션을 기대했던 스스로가 머쓱해졌다. “여기서부터 이 순서대로 가면 편할 거예요. 지난주 반찬통도 꼭 수거해 오셔야 해요!” ‘배달’을 위해 알아야 할 것은 그게 전부였다.
마지막 집, 빌라 사이를 헤매는데 커다란 종량제 봉투 앞에서 옷가지를 정리 중이던 어르신이 내 손에 들린 반찬통을 흘긋 보더니 말씀하셨다. “문 앞에 있어요.” “네, 새 찬들 문 앞에 둘게요!” 빈 통을 수거하고 내려오는 길, 어르신은 봉투를 옮기며 씨름하고 계셨다. “제가 할게요!” 외치며 달려갔더니, “괜찮아요. 여기 그냥 이렇게 둘 거라”라며 그제야 환히 웃어 보이셨다. “네, 어르신. 건강하세요!” 덩달아 활짝 웃음 지었다. ‘또 올게요’ 한마디를 덧붙이려다 그만두었다.
가벼워진 보따리를 이고 돌아오는 길, 눈길조차 주지 못한 사이 거리엔 녹음이 우거져 있었다. 학생들의 꺄르르 웃음소리가 초여름 볕으로 이글거리는 거리를 메웠다. 유난히 파란 날이었다.
2030세상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정용관 칼럼
구독
-

DBR
구독
-

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젊다면 ‘클린 겨드랑이’[2030세상/박찬용]](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07/28/126169995.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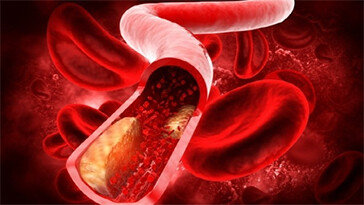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