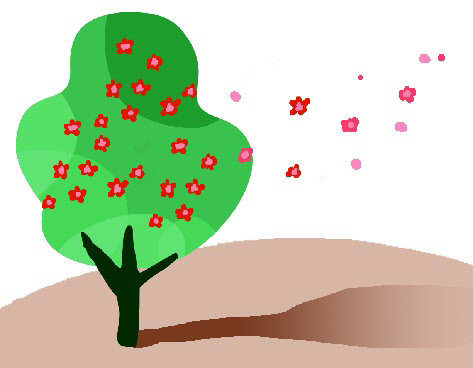
작고 붉은 꽃이 피는 나무가
있었다
어김없이
꽃이 진다고 해도 나무는
제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
어김없이 어느덧
흐릿한 뒤를 돌아보는 나무
제가 만든 그늘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어느덧나무 어느덧나무
제 이름을 나지막하게 불러보는 나무를
떠나간 사랑인 듯 가지게 된 저녁이 있었다
출가한 지 오래된 나무여서
가까이할 수 있는 것은 이름밖에 없었다
―심재휘(1963∼ )
이 시에서 작고 붉은 꽃이 피는 나무가 살았다는 첫 문장이 너무 좋다. 그는 어디서 나무를 만났을까. 작고 붉은 꽃은 얼마나 작고 얼마나 붉었을까. 사실 그 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었을 것 같은데, 시인은 그것을 어디에 감춰두었을까. 잊지 않으려는 듯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불렀다고 했다. 나무 아닌 것이 ‘어느덧’ 나무가 되었다는 말로도 읽힌다.
나도 이런 나무가 될 수 있을까. 마음속 나무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 나도 분명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꽃을 피웠다고 혼나지 않고, 꽃을 떨궜다고 비난받지 않고, 꽃이 피면 피는 대로, 꽃이 지면 또 지는 대로 그저 나무일 수 있을까. 그대로, 너대로, 네 이름대로 살렴. 이 시는 그렇게 응원하는 듯하다. 이 더운 날, 더운 지구 위에서 나무의 지지를 받고 싶다.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고양이 눈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이원주의 날飛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462〉](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08/16/126558404.2.jpg)


![낯선이가 준 의문의 쪽지, 노숙자 삶을 바꾸다 [따만사]](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927389.3.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