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 채모 상병이 무사히 돌아왔다면 오늘이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하는 날이다. 채 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고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 안타까운 사고가 긴 정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이후 1년 넘게 채 상병의 순직이 누구의 책임인지, 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를 놓고 여야 정치권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다투고 있다.
올해 5월, 7월에 이어 이달 19일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세 번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선 두 번의 특검법과 같이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특검을 포기하지 않을 기세이고 윤 대통령은 받아들일 기미가 없어 앞으로도 비슷한 과정이 쳇바퀴 돌 듯 반복될 수 있다.
‘野 특검법 강행 뒤 尹 거부권’ 반복 중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던 한동훈 대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말 한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반면 야당은 내심 공수처가 여권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한다. 공수처만 동네북 신세가 된 모양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내놓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 이를 수용할지, 아니면 특검이 다시 수사할지가 정해질 것이고 교착 국면에서 한 걸음 나아갈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수사의 엄밀성 못지않게 신속성이 중요한 이유다. 그런데 근래 들어 공수처 수사에 진척이 있다는 소식이 한동안 들리지 않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공수처에 고발장을 낸 것이 지난해 8월 말이었다. 공수처는 올해 1월 국방부와 해병대를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불러서 조사했고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VIP 격노설’을 언급한 김 사령관의 녹취 파일 등 자료도 여럿 확보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의혹의 핵심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과정에 윤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과정이다. 이제 ‘윗선’에 대한 수사로 나아갈 때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이첩 및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그 대상일 것이다. 공수처가 이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가 답보 상태로 보일 수 있지만 정중동(靜中動) 상태”라고 했다. 무턱대고 소환해 조사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준비에 만전을 기하려고 마냥 시간을 끌 사안도 아니다. 논란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관심은 낮아지고, 수사의 동력이 떨어져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채 상병 논란은 끝없이 제자리를 맴돌게 된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공수처의 돌파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오늘과 내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광화문에서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성장판 닫힌 제조업 생태계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오늘과 내일/우경임]청년에 고통 미루는 ‘대증요법’ 개혁, 의료뿐인가](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09/26/13011335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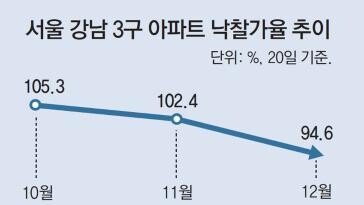
![크리스마스, 산타가 아무리 바빠도 지켜야 하는 ‘이 규정’[이원주의 날飛]](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717225.1.thumb.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