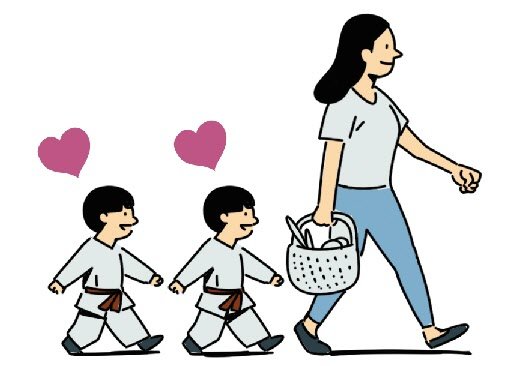
살다가 사는 게 막막할 땐 시장에 간다. 빈 장바구니 하나 들고서 털레털레. 오래된 동네에 동그랗게 파놓은 굴속 같은 시장에는 온갖 푸르싱싱한 것들과 맛깔스러운 냄새와 부대끼는 소란과 억척스러운 활력이, 터질 듯이 꽉 들어차 있다.

살다가 칭찬받고 싶을 때도 시장에 간다. 태권도 도복을 입은 쌍둥이 형제를 데리고 시장에 가면 아들내미만 둘이야? 쌍둥이야? 이만치 키우느라 고생했네. 참말로 장하네. 쫄래쫄래 날 따라오는 아이들 뒤로 쫄래쫄래 칭찬들이 따라온다. 그게 어찌나 뿌듯한지.
“내가 여기서 50년을 국밥 장사로만 애들 키워 장가보냈어. 근데 만날 장사한다고 애들을 못 봐서 사이가 살갑지가 않아. 평생 미안하지. 애기 엄만 힘들어도 애들이랑 맛있는 거 해 먹고 시간 많이 보내. 언제 다 키우나 싶어도 눈 깜짝할 새 쑥쑥 커선 가버린다. 그냥 사랑만 줘.”
외상을 달아둔 호떡집에도 들렀다. 애들 호떡을 사 먹였다가 지갑을 두고 와 난감해할 때 나중에 들러서 주라던 호떡 장수 할머니. 죄송해서 곧장 드리러 온 길이었다. 호떡 2개에 외상값 3000원을 갚았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아이들이 돈을 건네고 꾸벅 인사했다. 근데 할머니가 돌아서는 아이들을 붙잡는다. “둘이 사이좋게 나눠 먹어라.” 막 구운 호떡 하나를 건네준다. 손사래를 치는 내게 “애기 엄마, 투 플러스 원이야!”라며 할머니가 자글자글 웃는다. 그러니까 늘 이런다. 시장에 가면, 살아야지. 감사히 살아야지. 뭉클해져 돌아온다니까.
관계의 재발견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과 내일
구독
-

임용한의 전쟁사
구독
-

e글e글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뒷머리를 만져주며 실패담을 들려주던 그[고수리의 관계의 재발견]](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0/17/13024242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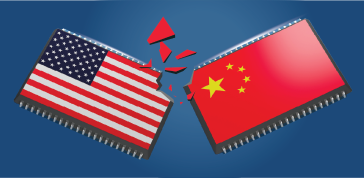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