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놓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위헌-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한 대표는 이후 수습책을 놓고 “대통령 탈당” “조속한 직무 정지” “질서 있는 퇴진” 등 헷갈리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놨다. 말이 너무 자주 바뀐 것은 물론이고 당내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때문인지 의원들과의 이견도 자주 표출되면서 혼란과 혼선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안에 대한 한 대표의 첫 공식 발언은 계엄 선포 이틀 뒤인 5일 처음 나왔다.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6일에는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전격적으로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가 7일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임기 등 당에 일임” 방침을 밝힌 뒤에는 ‘직무집행 정지’ 대신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탄핵 반대로 다시 선회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여당 대표의 말이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는가.
탄핵안이 5석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된 뒤에는 난데없이 ‘국무총리-여당 공동 국정 운영’을 들고나왔다. “누가 당 대표에게 그런 권한을 줬느냐”는 위헌과 월권 논란은 둘째치고 이런 중대한 방침을 최고위원회든 의원총회든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불쑥 발표할 수 있는 건지도 의문이다. 논란이 일자 “내각 운영에 당이 긴밀히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물러섰다.
정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니 어느 정도 입장이 달라질 순 있다. 그러나 40여 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국의 한 축인 여당의 대표가 어떤 게 진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말의 신뢰’ 차원을 넘어 현 시국을 여당이 제대로 수습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내란 수괴’ 지목된 尹…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2/10/13061566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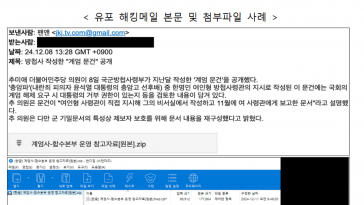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