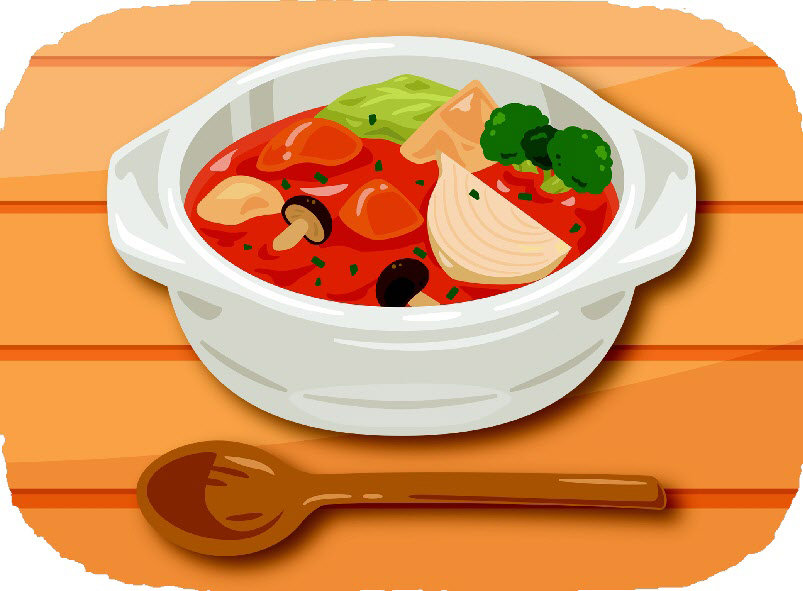
매일 비가 내리는 파리에서 겨울에 즐겨 먹는 음식으로 ‘포토푀(Pot au feu)’가 있다. ‘불 위에 올려진 냄비’ 정도로 해석되는 이 음식을 생애 처음 접했던 기억은 20여 년 전 연말이었다. 오페라 주변을 서성이다 뜨끈한 음식 생각이 간절해서 선택한 파리 2구의 드루앙 레스토랑은 그날도 문전성시를 이뤘다.

포토푀는 12월 크리스마스나 2월 스키 방학을 맞아 가족들이 시골 할머니 집에 갈 때 즐기곤 하는 프랑스 사람들의 솔 푸드로 유명하다. 프랑스 역사나 문학책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 음식은 16세기 신교와 구교의 다툼이 심했던 위그노 전쟁 시기에 프랑스를 지배했던 앙리 3세 왕이 즐겨 먹었다 하고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인 미라보는 이 음식을 ‘프랑스의 토대’라 불렀을 정도로 대중적인 음식으로 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19세기 프랑스 고전 요리의 형식을 완성한 앙투안 카렘도 자신의 첫 요리책에 이 음식을 소개했다고 하니 우리네 청국장이나 꼬리곰탕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포토푀는 할머니의 조리법을 대대로 이어받아 프랑스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가정식 요리다. 배추, 당근, 무, 감자, 셀러리와 같은 채소를 넣고 ‘뵈프 부르기뇽’이라 하는 쇠고기 사태 같은 부위를 압력솥에 월계수, 허브와 함께 넣고 1시간 30분 정도 뭉근히 끓여내는 방식으로 누구나 간단히 조리할 수 있다. 이때 쉬이 부서지는 감자는 따로 익힐 것을 권한다.
복잡한 기술이 요구되거나 값비싼 재료가 아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할머니들이 만들어 주는 음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집밥으로 사랑받는다. 어릴 적 먹었던 음식이 나이가 들어 다시 생각나는 이유 중 하나는 음식에 대한 추억의 맛이 뇌리에 박히기 때문이다.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던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리움은 더욱 깊어간다.
포토푀를 집에서 즐긴 적이 있다. 한참 동안 끓인 다음 쇠고기 기름을 걷어내고 생선 수프인 부야베스처럼 국물과 건더기를 따로 내어 가족이 한 식탁에 앉아 나누다 보면 음습한 파리의 겨울을 이겨낼 기운이 생겨난다. 거기에 구조감과 타닌이 적절한 보르도의 메도크 와인이나 코트 뒤 론 와인 한 잔을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정기범의 본 아페티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이주의 PICK
구독
-

글로벌 현장을 가다
구독
-

사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한국에 꼬리곰탕 있다면 프랑스엔 ‘포토푀’[정기범의 본 아페티]](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2/29/130749041.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