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는 여러 문화권에서 죽음과 애도를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져 왔다. 오래 피는 꽃이기에 변하지 않는 사랑과 기억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피터르 몬드리안(1872∼1944)은 검은색 격자 안에 빨강, 파랑, 노랑의 사각형들이 있는 밝고 강렬한 추상화로 유명하다. 그런 그가 국화를 많이 그렸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왜 국화를 즐겨 그렸던 걸까?
20세기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불리는 몬드리안은 사실 경력 초기에는 정물화와 풍경화를 그리는 사실주의 화가였다. 장프랑수아 밀레로 대변되는 프랑스 바르비종파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1900년부터 20여 년간 꽃에 매료돼 250여 점의 꽃 그림을 그렸는데, 그중 상당수가 국화였다. ‘국화’(1908∼1909년·사진)는 종이 위에 소묘용 크레용인 콩테로 그린 것으로, 커다란 국화 한 송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화가는 마치 꽃을 눈으로 해부하듯 매우 정교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가늘고 긴 국화의 꽃잎들은 꼬이고 흐트러지고 아래로 처지고 있다. 시들기 시작한 상태다. 잎은 이미 말랐는지 크기도 작은 데다 미완성으로 끝냈다. 실제로도 몬드리안은 생생한 국화가 아니라 시들기 직전의 꽃을 선택해 그리곤 했다. 꽃잎들의 강렬하면서도 구부러진 선 처리는 반 고흐의 ‘해바라기’를 참조했을 것이다.
몬드리안은 ‘꽃의 조형적 구조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해’ 꽃다발이 아닌 한 송이씩 그리는 걸 즐겼다고 밝힌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꽃의 조형미 때문에 선택했겠지만 이 그림을 그릴 즈음 그가 영적 진화를 강조한 신지학(神智學)에 빠져들었던 걸 감안하면 국화가 가진 상징성에 매혹됐을 가능성도 크다.
이은화의 미술시간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여행스케치
구독
-

어린이 책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몬드리안의 국화[이은화의 미술시간]〈352〉](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1/01/130771995.1.jpg)

![[광화문에서/신수정]“한국서 제조업은 미친 짓”… 가업승계 거부하는 2·3세대](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787233.1.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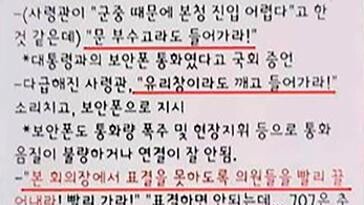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