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서 ‘뼛속 민주시민’ 성장한 청년층
계엄으로 후진국 만든 이들에 싸늘한 분노
살얼음판 지속은 미래 역사에 죄 짓는 것

내 사무실은 캠퍼스 내 1980년대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는 ‘아크로폴리스 광장’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사흘이 지난 금요일 저녁, 광장은 수십 년만에 처음 보는 인파의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의아했던 것은 수업이 다 끝난 상당히 늦은 시간에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라인을 설치하고 학생회에서 학생증 검사를 해서 입장하는 긴 줄이 늘어서 있다는 점이었다. 어떻게든 세(勢)를 불리고 참여자들을 늘려야 할 정치집회에 ‘입장객’을 가려서 받다니 이해하기 어려웠다. 입장하는 데에만 3시간이 걸려 정작 본집회가 시작된 오후 9시가 되어서는 관악산에서 내려온 12월의 모진 눈비바람이 온통 학생들을 할퀴고 지나가는 것을 보자니 요령부득이라는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내용을 알고 보면 이유가 있다. 학생들이 ‘전체학생총회’를 소집한 것이고, 학생회칙에 의하면 재학생의 10%, 즉 1700명이 모여야 총회가 성립이 된다고 한다. 어림잡아, 혹은 추산으로 1700여 명이 아니라 정확한 절차와 숫자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결국 2707명이 모여 총회가 성립됐으며, 이들은 이후 대통령 퇴진 요구안을 의결했다. 투·개표에만 1시간이 추가로 소요된 것은 덤이었다.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태어나 선생님에게 매 맞아가며 민주주의를 책으로 배운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민주화 이후 선진국에서 태어나 민주시민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에 비해 민주주의를 더 잘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청년층이 보여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치 참여와 발언들을 이해할 수 있다. 기성세대가 ‘계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처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면, 청년세대가 계엄이라는 현실에 대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은 싸늘한 경멸의 분노일 것이다. 이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격분하지도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일 때 태어난 사람들로서 어느 날 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든 사람들을 경멸할 따름이며, 이러한 차가운 분노는 식지도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젊은이들이 있다. 그날 국회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던 몸싸움에서 완전 무장을 한 채 민간인들에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던 앳된 계엄군도 이들과 같은 교과서로 공부한 세대이다. 어쩌면,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폭력과 유혈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한국 민주주의의 교과서에 피로 아로새겨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5·18의 역사, 혹은 백남기 농민의 희생으로 쌓아 올리고, 촛불시위를 통해 드러났던 강력한 비폭력의 원칙은 계엄군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 어떤 갑작스러운 계엄령과 명령 체계로도 깰 수 없었던 것 같다.
설마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시위대와 경찰이, 혹은 공수처와 경호처가, 혹은 그 어떤 누구라도, 명령과 명령이 대치하고 조직과 조직이 맞부닥칠 때, 단 한 사람, 단 한 번의 오판, 단 한 발의 총성, 그 찰나의 스파크가,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태워서 잿더미로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이런 상황을 빨리 해결하지 않는 것은 그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같으며, 역사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곳은 당신의 앳된 딸들과 아들들이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사히 지나간다면, 그래도 우리가 얻은 소득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의 청년세대가 얼마든지 우리 공동체를, 기성세대 못지않게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훌쩍 성장했다는 사실이 아닐까. 혹여 당신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나 민주화에 약간씩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신기루 같은 것인가를 이번에 새삼 깨닫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 ‘포스트 계엄 세대’는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고비를 넘긴 세대라고,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는 나라를 믿고 맡겨도 괜찮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동아광장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이주의 PICK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글로벌 석학 인터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동아광장/박원호]포스트 계엄 세대의 탄생](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1/06/130803686.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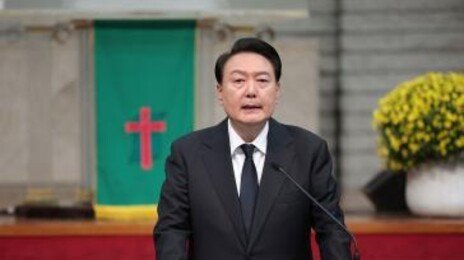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