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씨의 집안은 고조부 증조부 조부 아버지 그리고 황씨에 이르기까지 5대에 걸쳐 화(靴·목이 있는 신발)와 혜(鞋·목이 없는 신발)를 제작하는 화혜장(靴鞋匠·일명 갖바치) 일을 해 왔다.
현재 한국의 유일한 화혜장인 황씨는 2일 중요무형문화재 화혜장 기능보유자로 인정 예고됐다. 공식절차만 거치면 할아버지(황한갑·黃漢甲·1889∼1982)에 이어 두 번째 ‘갖바치 인간문화재’가 된다.
그의 할아버지는 고종과 엄비 등 왕가의 신을 만들던 조선왕조 최후의 왕실 갖바치.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만 해도 남부러울 게 없었다. 신분제가 무너진 뒤 양반의 전유물이던 꽃신에 대한 평민의 수요가 몰렸기 때문.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른바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꽃신 대신 구두를 신기 시작했고 갖바치들도 하나둘 일손을 놓았다. 그만 유일하게 장인의 길을 갔고, 71년 화장(靴匠) 기능보유자로 지정됐다.
손자 황씨는 16세 때부터 할아버지 어깨너머로 화혜장 일을 배우다 군을 제대한 직후인 73년 아예 이것을 업(業)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할아버지가 80대 노인이 됐는데 아무도 대를 잇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나 아니면 한국에서 화혜장이 없어지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들었던 것. 자동차 수리공이던 황씨의 아버지도 이 일을 배우긴 했지만 제대로 전수받기에는 나이가 많았고, 불행히도 고혈압으로 78년 일찍 세상을 떠났다.
“할아버지가 연로하시니 마음이 급했죠. 주무시는 걸 깨워서 계속 묻고 배웠어요. 그런 손자가 기특했던지 귀찮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황씨는 그 뒤로 10년 동안 조부의 기술을 고스란히 전수받았다. 그 뒤 황씨는 옛 문헌과 복식학자의 도움을 얻어 사라진 전통신 재현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성과가 현재 3켤레밖에 남아 있지 않은 적석과 청석을 되살려낸 것. 조선시대 왕과 왕비가 의례 때 신던 것이다. 황씨는 이 작품으로 99년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을 받았고 이 밖에 다른 작품으로 각종 대회에서 24차례 수상했다.
보통 꽃신을 하나 지으려면 하루 6∼7시간씩 일해 최소 사흘, 길게는 일주일까지 걸린다. 72가지에 이르는 공정을 하나하나 손으로 하기 때문. 그래서 가격도 한 켤레에 수십만원이나 나가고, 상류층 인사 가운데 고객이 많다.
27년 동안 남편을 돕다 보니 부인 김미정씨(48)의 솜씨도 준(準)화혜장이다. 황씨는 “화장 일을 한다고 했더니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생각하고 결혼했다고 고백하더라”면서도 아내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위치까지 오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고마워한다.
두 아들 덕성(26)과 덕진씨(24) 역시 황씨의 든든한 후견인. 신발을 지을 때 바늘로 쓰는 멧돼지 털이 떨어지자 아들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멧돼지를 수배하기도 했다. 황씨를 이을 6대 화혜장은 둘째 덕진씨가 노리고 있다. 큰아들 덕성씨도 뜻을 보였지만 둘째가 손재주가 더 좋아 부인과 상의 끝에 결정했다는 것.
“쉬운 길이 아니란 걸 뻔히 아는데 부모라고 강요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 잇겠다고 하니 기특할 뿐입니다.” 사학을 전공한 덕성씨는 전통을 잇는 아버지의 영향 탓인지 취미로 유적답사 동호회를 이끌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여행 서적도 출간할 계획이다.
“우리 전통신은 사람이 신에 맞추는 게 아니라 신이 발 모양에 맞게 서서히 변하면서 사람에 맞추어 가는 게 특징이죠.” 황씨는 ‘오랜 것의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이렇게 강조했다.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
인물 포커스 >
-

변종국의 육해공談
구독
-

송평인 칼럼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인물 포커스]'서태지와 아이들'서 가요제작자 성공 양현석](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4/01/27/6912471.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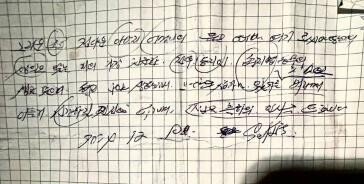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