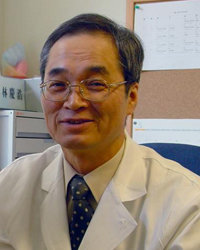
이런 대기록은 내과 임경호 교수(52)가 있기에 가능했다.
1982년 겨울. 임 교수가 막 스태프가 됐을 때다. 당뇨병 환자 2명이 들어왔다. 다리를 절단해야 할 정도. 알고 보니 사소한 상처를 다스리지 못해 병이 커진 것이었다. 그들은 당뇨병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이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환자가 계속 들어왔다.
‘병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의사의 책임이 더 크다.’ 임 교수가 내린 결론이었다.
임 교수는 먼저 환자와 가족, 일반인에게 당뇨병 지식을 전하기 위해 당뇨병 교실을 개설했다. 이어 환자들의 모임을 지원해 줄 것을 병원에 요구했다. 병의 당사자인 환자와 가족들이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병원 1층에 있는 ‘엄나무회’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당뇨병 환우 모임이다.
실제 접한 당뇨병 환자의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 특히 민간요법의 폐해가 컸다.
언젠가 환자의 대변검사를 했는데 파충류에서나 볼 수 있는 기생충이 여러 마리 검출됐다. 알고 보니 ‘청개구리를 날로 먹으면 당뇨병을 고칠 수 있다’는 뜬소문을 환자가 그대로 실행했던 것이다. 임 교수는 기가 찼다.
임 교수는 민간요법도 유행을 탄다고 말했다. 80년대는 해당화 뿌리가 대표적이었다.
당시 환자 열이면 열 모두 이것을 먹을 정도였다. 이어 당살초(糖殺草)→쇠뜨기 풀→날콩→굼벵이→알로에→상황버섯으로 유행은 이어졌다.
임 교수는 “검증이 안 된 것을 굳이 찾을 필요가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약의 효능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가령 냉동 보관해야 했던 인슐린도 상온보관으로 바뀌어 당뇨병 환자라도 장거리여행이 가능할 정도라는 것이다.
임 교수가 생각하는 당뇨병은 어떤 것일까. 임 교수는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당뇨병을 ‘만복(萬福)의 시작’ 쯤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당뇨병은 잘만 관리하면 삶의 질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게다가 병을 치료하려면 금주 금연 적당한 운동이 필수죠. 규칙적으로 병원에 다니다보니 암 등 더 큰 질환을 미리 찾아낼 수도 있어요. 하늘이 내려 준 ‘행복한 경고’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당뇨병 교실은 매주 수요일 오후 2∼3시 이 병원 P동 9층 강당에서 열린다. 당뇨병 환자는 물론 가족과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하다. 물론 무료다. 02-2270-0302,0177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메디컬 피플 >
-

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메디컬 피플]아주대 재활의학과 이일영교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4/05/23/692104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