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쁨 반, 아쉬움 반입니다. 한국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늦은 감도 있습니다.”
초대 극지연구소장인 김예동(金禮東·50) 박사는 한국의 극지탐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1983년 미국 루이지애나주립대에서 유학 중 지도교수의 권유로 남극에 첫 발을 내디뎠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였다.
“당시 한국인에게 남극은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남극이라고 하면 고작 ‘아문센’ ‘개썰매’ 정도만 연상할 정도였으니까요. 바다얼음 위로 비행기가 착륙한 뒤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그야말로 ‘완전 백색’이었습니다.”
그 1983년은 김 소장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한 해였다. 대한항공(KAL) 007기 격추사고에서 운항기관사였던 형을 잃은 것.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으나 그의 의지를 꺾기는 힘들었다.
“지도교수가 처음 남극을 구경한 제게 ‘경치가 아름답느냐’고 묻더군요. 고개를 끄덕였더니 ‘앞으로 자주 올 것이다’고 말하더군요. 당시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남극 탐험은 올해 초까지 이어져 모두 20차례에 이른다. 거의 1년에 한 번씩 남극에 간 셈이다.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많은 방문 횟수다. 20여년 가운데 극지 탐험 등 출장시간이 절반에 이른다.
올해 초의 방문 목적은 ‘탐험’이 아니었다. 지난해 말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숨진 고(故) 전재규 대원의 사후 현장조사 때문이었다. 김 소장은 전 대원 이야기가 나오자 눈시울을 붉혔다.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지금까지 남극에 파견된 대원들이 비슷한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면서 모두 ‘운이 좋았다’며 넘어가곤 했는데….”
전 대원은 세상에 많은 것을 남기고 떠났다는 게 극지연구소 연구원들의 생각이다. 특히 연구소의 위상이 높아지고 내년부터 남극 탐험의 필수 장비인 쇄빙선의 설계가 시작되는 것도 전 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전 대원의 여동생 전정아씨(26)는 현재 이 연구소 대외협력팀에서 극지연구의 중요성을 외부에 알리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위험이 많은 줄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곳이 남극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실험실이기 때문이죠.”
김 소장에게 남극은 ‘보물창고’다. 처음 갔을 때에는 기후 등을 예측할 수 없는 동토(凍土)에 불과했으나 20여년간의 연구를 통해 남극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속속 밝혀내고 있다.
“최근 세종기지가 있는 킹조지섬 북쪽을 탐사하던 중 메탄가스와 물로 이뤄진 가스 수화물을 발견했습니다. 석유를 대체할 차세대 연료로 꼽히죠. 한국의 연간 가스 소비량의 300년분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남극에서는 자원개발이 금지돼 가스 수화물을 채굴할 수 없으나 앞으로 개발이 시작되면 채굴 권리인 광권(鑛權)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소는 내다보고 있다.
김 소장은 남극 주변 해역 먹이사슬의 밑바닥에 있는 크릴에도 관심이 많다. 지금은 낚시미끼 등으로 쓰이는 수준이지만 식량화하면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지난해 국내 한 수산회사는 남극 해역에서 약 1만5000t의 크릴을 잡아 180억원의 수입 대체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 소장의 무대는 남극뿐만이 아니다. 2002년 4월 말 설립된 북극 다산기지도 그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극지 전문가들이 많다. 제안부터 입지 설정, 정부 당국자 설득까지 거의 모든 과정에 김 소장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한국이 무엇 때문에 극지 연구를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김 소장에게 물었다.
“미래를 위한 투자죠. 남극은 지구상에서 순수하게 과학연구를 통해 국가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남극 개발이 이뤄지기 전까지 우린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을 부지런히 찾고 기술을 연마할 겁니다.”
안산=차지완기자 cha@donga.com
김예동 소장은
―1954년 서울 출생
―1977년 서울대 지질학과 졸업
―1987년 미국 루이지애나주립대 지구물리학 박사
―2001년 7월∼현재 과학기술부 국가지정연구실 ‘북극 환경·자원연구실’ 연구책임자
―2002년 4월∼현재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 한국대표
―2003년 9월∼현재 한국해양연구원(KORDI) 극지연구소장
―2003년 12월∼현재 대한지구물리학회 회장
인물 포커스 >
-

오늘과 내일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카버의 한국 블로그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인물포커스]거미 수목원 ‘아라크노피아’ 문연 김주필교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4/07/13/692480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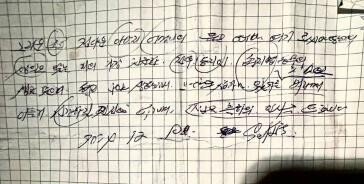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