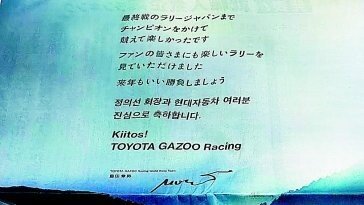그는 출생 직후 실시한 유전검사에서 30대 초반에 심장병 등으로 사망할 것이며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불량 유전자’ 판정을 받았다. 원래 이름은 빈센트.
유전형질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주인의 꿈을 키우던 그는 불법 중개인을 통해 유전자를 사들여 제롬으로 변신했다. 최우량 유전인자를 갖췄지만 사고로 반신불수가 된 유진(주드 로)의 피와 머리카락을 이용해 각종 검사를 속여 넘겼다. 제롬은 토성으로 출발하기 직전 정체가 탄로 날 위험에 빠지지만 결국 우주선에 탑승하는 데 성공한다.
1998년 개봉한 미국 영화 ‘가타카’의 줄거리다. 이 영화가 그려낸 ‘가까운 미래’엔 유전형질의 우열이 개인의 사회적 신분을 가르는 절대 기준이다. 최근 미국에서 임신 초기에 태아의 유전자를 검사해 나중에 암, 비만 등에 걸릴 가능성을 미리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낙태하는 일이 늘고 있다니 더는 미래의 이야기로만 볼 수 없게 됐다.
제롬에게 유전자를 빌려준 유진의 이름은 우생학을 뜻하는 유제닉스(eugenics)에서 따왔다. 우생학은 1880년대 초 영국의 유전학자 프랜시스 골턴이 창시한 학문.
1822년 2월 16일 영국 버밍엄 지방에서 태어난 골턴은 킹스칼리지 등에서 의학을 전공했으며, 진화론의 아버지 찰스 다윈과 사촌 사이였다. 그는 “천재는 환경보다 유전이 만든다”고 주장했고, 이런 생각을 발전시켜 인류 개조를 위한 우생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세기 초 서구의 엘리트 중 다수가 이런 아이디어에 동조했다. 케임브리지대 출신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 소설 ‘우주전쟁’의 작가 허버트 조지 웰스 등도 우생학에 우호적이었다. 그 영향으로 서구의 여러 나라는 범죄자 등을 단종(斷種)시키는 법안을 만들기도 했다.
독일의 히틀러가 ‘인종청소’의 이론적 틀로 우생학을 동원하고 난 뒤에야 많은 사람들이 위험성을 깨달았다. 이후 우생학은 상식인들 사이에서 ‘사이비 과학’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른바 ‘혈액형 성격학’도 우생학의 잔재다. 황화론(黃禍論)이 일던 20세기 초 독일의 우생학자들은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혈액형으로 증명하고 싶어 했다. 서양인에게 많은 O형과 A형이 동양인 가운데 비중이 높은 B형보다 우수하다는 식이었다. 훗날 일본 학자들이 ‘우열’을 ‘성격’이라는 말로 바꿔 혈액형 성격학을 만들었다.
배경이 이런데도 지금까지 혈액형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이들을 보면 한때 우생학에 현혹됐던 서구 지식인들이 이해되기도 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베링해협 횡단 >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담배 이제는 OUT!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베링해협 횡단/2월20일]“내일 라블렌티야로 떠난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7/02/21/7000436.1.jpg)

![시선끌기 무리수가 빚어낸 하니 출석의 허무한 결말[광화문에서/박선희]](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502072.1.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