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역사박물관 ‘대지진 이후 건축전’ 기획한 이가라시 교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나니 기억의 소중함을 알겠더군요. 지진과 쓰나미(지진해일)를 기억할 수 있는 마을로 재건하는 문제를 연구 중입니다.”
이가라시 다로(五十嵐太郞) 일본 도호쿠(東北)대 대학원 공학연구과 교수(45). 그는 지난해 3·11 동일본 대지진으로 대학 건물이 붕괴된 뒤 가건물에서 강의하고 연구한다. 건축사를 전공했고 자신도 대지진의 피해자인 이가라시 교수의 요즘 연구 주제는 ‘재해와 건축’이다. 5∼22일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건축전’도 그가 기획과 감수를 맡았다. 부제는 ‘일본의 건축가들은 대지진 직후 어떻게 대응했는가’다.
전시를 위해 3일 방한한 그는 “지진과 쓰나미는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므로 피해를 봤던 기억을 미래에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지진 현장에서는 쓰나미에 휩쓸려 온 관광버스가 옥상에 올라앉은 건물과 철골 프레임만 남은 청사 등 몇몇 피해 건물을 보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파괴된 집을 복원 설계해 그 모형을 지진 피해자들에게 선물하는 건축가도 있다.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에 대해 건축가들이 내놓은 제안들도 눈길을 끈다. 지진 잔해로 콘크리트 블록을 쌓아올린 피라미드 안에 후쿠시마 원전을 봉인하고 석관(石棺)으로 만든 작품,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신사(神社)로 설계한 작품도 있다. 원자로 건물에 일본식 지붕을 상징물로 얹어 향후 1만 년 이상 원자로를 신사 건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그는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 내진기술은 발달했지만 쓰나미에 견디는 건물을 짓는 기술은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일본 내에서도 쓰나미에 견디는 건물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쓰나미가 몰려오면 빨리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다.
3·11이 일본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일본 사회가 조각나 버렸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정부마저 못 믿게 됐으니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개인주자들, 반대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공동체를 복원하려는 사람들이 혼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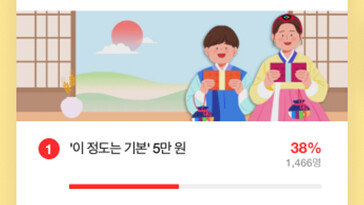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