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드림/도시락 토크 CEO와 점심을]<13>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


1983년 평사원으로 입사해 27년 만인 2010년 사장에 오른 유한킴벌리 최규복 대표(58)는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 낸 버팀목은 무엇이냐는 덕성여대 회계학과 이은진 씨(23)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최 대표는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가 21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유한킴벌리 대전공장에서 마련한 ‘청년드림 도시락 토크-CEO와 점심을’ 행사에서 “집안이 어려워 대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학업에 더 매달렸다”며 “이 때문에 회사에서도 경기가 어렵고 경쟁이 치열할 때가 더 발전하고 성장할 기회라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유한킴벌리가 원하는 인재조건에 대해 ‘도전정신과 균형감, 독창성(thinking out of box)’을 꼽았다. 그는 “신입사원들이 ‘회사가 안정적이어서 입사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답답한 느낌이 든다”며 “입사하면서 ‘이 회사에서 임원이 되겠다’는 큰 목표를 세우라”고 조언했다.
유한킴벌리는 최근 시니어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화장지와 기저귀 등 생활용품 중심이었던 이 회사가 새로운 도전을 한 것이다. 최 대표는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시니어(노인)라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시니어 산업의 성장이 더디다. 다른 기업도 선뜻 뛰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가 기회라고 보고 적극 투자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자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경영학과 졸업생 정초희 씨(25)는 “이익의 극대화가 기업의 유일한 목표냐”고 물었다. 최 대표는 경영학 원론과 실제는 다르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주와 회사 구성원, 사회의 균형 성장이 중요하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만으로 기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됐다. 우리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나무도 심고 환경에 나쁜 공정도 줄였다.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존경받는 기업’에 선정됐고 모두가 근무하고 싶은 회사가 됐다고 본다.”
최 대표는 “트렌드와 혁신을 만들려면 타인의 지혜를 빨리 습득하고 이를 상품화하려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자신감과 겸손, 호기심 등 3가지 덕목이 그런 인재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숙명여대 법학과 정세흔(25),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김혜련(22), 상명대 국제통상학과 신효원(22), 김천과학대 작업치료과 옥은아 씨(22) 등이 참석해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청년드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동아리
구독
-

어린이 책
구독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청년드림]“기사 주제 어떻게 정하나요” 질문 쏟아져](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0/10/28/10366454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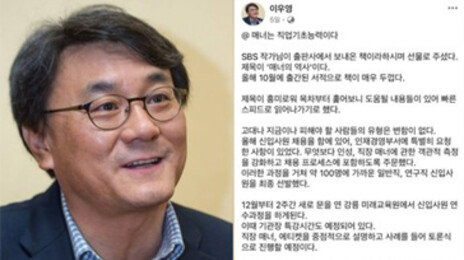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