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문화시민연대 표혜령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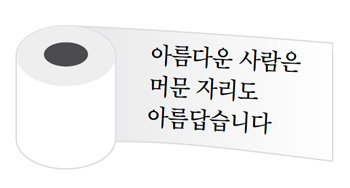
“사랑은 아낌없이 주고도 혹시 모자랄까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같은 한 줄짜리 글이나 유명 인사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에피소드를 적은 글도 있다. 최근에는 메르스 사태로 손을 제대로 씻는 방법이 그림과 함께 실리기도 했다.
전국 학교 병원 군부대를 포함해 누구나 신청만 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 스티커는 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16년 전부터 만든 것이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는 글귀 역시 이 단체 표혜령 대표(65)의 아이디어였다. 》
1999년 울산YMCA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표 대표는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학생들이 너도나도 침을 뱉고 있었던 것. 한 학생에게 “왜 바닥에 침을 뱉느냐”고 묻자 “요즘 침을 튕겨서 원하는 자리에 맞히거나 누가 멀리 나가게 하는지가 유행”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당연히 복도와 화장실이 더러울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침을 뱉지 않게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없을지 고민했다.
관심을 갖고 둘러보니 더러운 공중화장실이 눈에 들어왔다. 지금 한국의 공중화장실은 깔끔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참담한’ 수준이었다. 바닥 곳곳에서 발견되는 침과 가래는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휴지도 비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공중화장실을 생각하면 더럽고 불쾌하고 무섭다’는 답이 돌아왔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와 2002년 월드컵 유치가 결정됐을 때였다. 표 대표는 “외국인이 그런 모습을 보면 한국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가질 것 같아 걱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출범한 배경이다. 처음에는 “깨끗이 사용합시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운답니다”라는 글귀를 붙였다. 변화는 없었다. 어느 화장실 사용자는 그 글을 볼펜으로 찍찍 긋고 “(화장실 아줌마가) 울거나 말거나”라고 썼다. 명령어로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은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됐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도록 시민의식을 바꾸는 운동이 화장실문화시민연대를 주축으로 일어났다.
화장실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찾아냈다. 물에 잘 녹는 휴지를 비치하도록 하고, 가방을 거는 고리가 너무 높아 키 작은 사람들이 쓰기에 불편하다는 점에 착안해 낮은 위치에도 가방걸이를 설치하도록 했다. 짐이 많은 사람을 위해 양변기 뒤편에 폭 15cm 이상의 받침대를 설치하자고 건물주와 관공서에 제안했다. 핸드백을 두거나 소지품 케이스를 꺼내는 일이 많은 여성은 당연히 박수를 보냈다.
화장실 미화원을 배려한 법안 추진
미화원들이 직업에 자긍심을 갖도록 매년 ‘우수관리인’ 시상식도 한다. 전국 관리인 중 성실하고 모범이 될 만한 우수관리인을 300명씩 뽑아 시상했다. 모든 사람이 꺼리는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그 자체만으로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이 표 대표의 생각이다.
최근에는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는 여성 관리인을 위해 법률 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국회의원이 7월 대표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화장실을 청소할 때 문 앞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자도 화장실에 갑자기 여자가 들어오면 당황스럽지만 청소하는 여성 미화원도 민망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
일부 남성은 “남자 청소인을 구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구인공고를 해도 남자는 잘 오지 않는다. 법률이 강제가 아닌 권유하는 형태만 돼도, 서로 최소한 ‘마음의 준비’는 한다든지 여성 미화원이 청소하는 상황이 불편한 사람은 다른 층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장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16년 동안 더 깨끗하고, 편리해진 한국의 공중화장실이지만 외국인 눈에는 여전히 충격적인 풍경이 남아 있다. 화장실 안에 있는 쓰레기통이다. 유튜브에서는 수년 전부터 ‘한국의 추악한 화장실 문화(Korean disgusting toilet)’라는 키워드로 놀림감이 되고 있다. 외국인들은 “이 정체불명의 휴지 산을 보기 두렵다” “왜 악취가 나는 뒤처리 휴지를 이렇게 모아두고 있는 것이냐”고 말한다. 서울도시철도공사(5·6·7·8호선)는 2012년부터 휴지통을 점진적으로 없애기 시작했다. 2014년 말 남자화장실, 올해 4월부터 여자화장실에 전면 도입됐다. 송파구청 역시 2013년부터 위생박스를 제외하고는 휴지통을 없앴다. 서울시청도 점진적으로 휴지통을 아예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심 중이다.

화장실은 문화다. 밥을 손으로 먹는 것과 포크를 쓰는 문화에 우열이 있을 순 없다. 화장실 변기에 휴지를 바로 넣느냐, 아니면 따로 쓰레기통에 분리해 버리느냐 역시 누가 옳은지 답은 없다. 그러나 화장실이 휴지로 발생한 악취 때문에 불쾌한 장소가 된다면 문제가 다르다.
화장실 하수 처리 과정은 복잡하기만 하다. 침전 역할을 하는 정화조를 거쳐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간다. 오염의 농도를 BOD라고 하는데 생분뇨가 2만 PPM 정도다. 2만 PPM을 물로 희석시키려면 희석수를 50배 넣어야 한다. 정화조에서 처리한 뒤 하수처리장을 거쳐 강으로 나간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염 하수를 정화하는 작업을 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유럽에서도 가정에서 쓴 물이나 용변 본 물을 따로 처리하게 된 것은 1870년대 즈음의 이야기다. 페스트균이 쥐를 매개체로 삼아 급속도로 번지면서 위생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하수가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깨달은 영국이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모았다가 정화한 뒤 버리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오수에 대한 규정이 처음 생긴 것은 근대화로 넘어가던 광무 시절의 훈령이었다. “아무 데나 버리지 말고 청계천에다가 버리라”는 것이 처음으로 나왔다. 일제강점기에 정화조를 만들기 시작했다. 1920년대 세운 연세대 언더우드 기념관을 포함해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있던 현재의 서대문구 충정아파트가 초기 형태의 정화조였다.
하수처리장이 생긴 것은 1960년대부터다. 인구 600만 명이 넘는 서울에 최종적으로 중랑·탄천·가양(선암)·난지 등 총 4개의 하수처리장이 완공된 것이 1990년이었다. 현대식 화장실 시스템이 정착한 기간은 예상보다 짧은 편인 셈이다.
지난 16년간 표 대표가 이끈 화장실문화시민연대는 공공화장실 문화를 몇 단계 성숙시켰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표 대표는 손수건 다섯 장을 꼭 쥐여줬다. 전기를 많이 쓰고 고장도 잦은 화장실 핸드드라이어를 없애기 위해 손수건 쓰기 운동에 함께 동참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다. 지금까지는 위생과 편리를 목표로 두었다면 다음은 환경이라는 것.
10년 뒤, 한국의 공중화장실 모습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토요일에 만난 사람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어린이 책
구독
-

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토요일에 만난 사람]“佛畵에 빠져 100억 쾌척까지… 인연이란 게 참 묘하지”](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5/11/21/74910059.1.jpg)

![‘이재명 1R’ 재판부는 왜 징역형을 선고했나[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83028.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