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동아일보]<4> ‘한국농구 산 역사’ 방열 농구협회장

“내일 아침 동아일보∼, 내일 아침 동아일보∼.”
목이 터져라 소릴 질러대며 신문을 팔았다.
서울 교동초등학교 3학년 때인 1950년 10월쯤으로 기억된다. 동아일보사는 내가 살던 서울 종로구 인사동 97번지에서 10분이면 도착하는 곳에 있었다. 오후 서너 시 신문사 후문으로 달려가면 벌써 신문팔이 소년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다. “철커덕 철컥” 하는 기계음과 기름 냄새가 진동한다. 윤전기 위엔 이불보다 큰 흰 종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원기둥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하얗던 종이가 시커먼 잉크를 뒤집어쓰고 절단기에서 두부처럼 잘라져 놓인다. 동아일보다.
동아일보는 우리 집 신문이었다. 부친께서는 광복 후 조선서적인쇄 주식회사 사장을 지내신 관계로 언론과도 관련을 맺은 분이셨기에 항상 신문을 접하고 자랐다. 집에선 일 년에 한 번씩 도배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초배지는 모두 동아일보였다. 그래서 우리 집은 다락에도 동아일보, 벽에도 동아일보, 방바닥까지 사방팔방 동아일보 천지였다. 1948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버님에게 언문과 한문을 배웠다. 교과서는 바로 동아일보였다.



며칠 전 아침 출근길에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동아일보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내년 1월 3만 호 발행을 앞둔 동아일보와 관련된 일화에 대한 원고 청탁을 해 왔다. 또 한 번 나는 머뭇거림 없이 “글쎄요∼ 동아는 나와 여러 가지로 인연이 있는데”라며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만사 제쳐 두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지난 세월을 다시 돌아보게 해준 동아일보는 여전히 나를 새롭게 일깨우고 있다.

방열 농구협회장
-
- 좋아요
- 1개
-
- 슬퍼요
- 1개
-
- 화나요
-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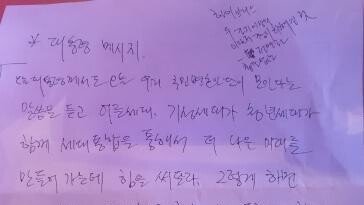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