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식 서해문집 대표
“문명의 축소판 읽는 재미 너무 커”
해외 고서점 돌며 희귀본 구입, 사재 털어 기록문화 수집-보존
“경제적 효율 떠나 출판인의 사명”


서해문집 김흥식 대표(61)는 몇 년 전부터 각국의 오래된 백과사전을 사 모으는 재미에 푹 빠졌다. 해외 고서적 거래 사이트를 뒤지고 해외에 나갈 땐 꼭 고서점 거리를 찾아다니며 20여 종을 모으느라 쓴 돈만 1억 원이 넘는다. ‘체임버스 백과사전’(1728년·영국)처럼 비싼 건 한 질 가격이 3000만 원을 호가한다.
김 대표는 출판이라면 무릇 고전과 기록물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고전 신봉주의자’다. 책이란 ‘언론’ ‘기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믿는 ‘원칙주의자’이기도 하다. 그의 남다른 취미생활 역시 사명감으로 추진 중인 출판문화 아카이브(체계적 수집과 보존) 작업의 일환이다.
출간해도 손해 보는 책인 걸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맥락을 아는 데서 진짜 논리와 지식이 나온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옛날 신문을 좋아해 거의 모든 신문을 섭렵한 그는 “이 자료를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촛불혁명은 잘 알아도 그게 일어나기까지 누적된 민주주의 전통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시민들이 적극 참여한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도 민주주의를 진전시킨 중요한 역사지만 잘 모르잖아요. 문명은 조각나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과 연결된 과거를 모르면 논리 없이 부분만 보다 끝나버립니다.”
‘출판 아카이브총서’ 시리즈는 전문 연구자들과 함께 광고로 본 잡지, 영화, 성명서 등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각국의 오래된 백과사전 역시 아카이브총서의 하나로 준비 중이다. 백과사전이 다루는 사안의 분량과 방식, 집필자의 시각, 백과사전의 사회적 위상 등 시대상에 대해 알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그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신문과 백과사전의 아카이브 작업은 꼭 끝마치고 싶다”고 소망했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
- 좋아요
- 1개
-
- 슬퍼요
- 1개
-
- 화나요
- 1개
![“멀쩡해 보여서 샀는데” 당근서 산 아이폰 ‘수리비 폭탄’ [알쓸톡]](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067944.5.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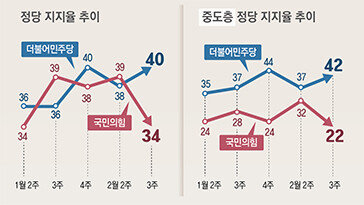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