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큰 폐단으로 지적되는 대목은 ‘개각예고제’. 이는 JP의 자민련 복귀예고 등 공동정권의 ‘생래적(生來的)’ 성격에서 비롯된 측면이기는 하다. 하지만 일찌감치 예고된 개각으로 몇개월동안 각 부처가 심각한 난맥상을 나타냈다. 업무보다는 인사의 향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등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이완됐다는 게 청와대가 파악한 실태였다.
이는 민간부문의 민원처리 지연 등 부작용을 초래, 결과적으로 불필요하게 국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조차 제기됐다.
또 현역장관들이나 후보물망에 오른 인사들에 대해 깊은 사려없이 과도한 여론검증을 거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준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권력핵심인사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을 거명하면서 여론의 검증을 겨냥했던 것도 혼란을 부추기고 신뢰성을 실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이같은 문제점들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중시하는 명분과 절차를 위한 ‘기회비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 좌고우면(左雇右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총선 출마권유를 둘러싸고 권력핵심과 장관 및 대통령수석비서관 사이에 빚어진 갈등도 앞으로 치유해야 할 상처다. 청와대는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들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게 사실. 장관들은 장관들대로 “대통령도 별 얘기를 안하는데 왜 주변에서들 그러느냐”고 반발했고, 권력핵심인사들은 드러내놓고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장관들의 충성도가 문제”라고 성토했다. “대통령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얘기다.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의 경질과 관련해 외교부 안팎에서 “차관인사에서 정권실세의 뜻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것도 김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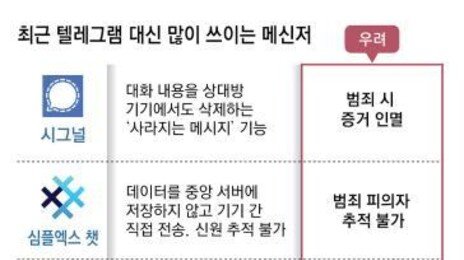
![[특파원 칼럼/임우선]미국이 믿는 신이 변하고 있다](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131768.1.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