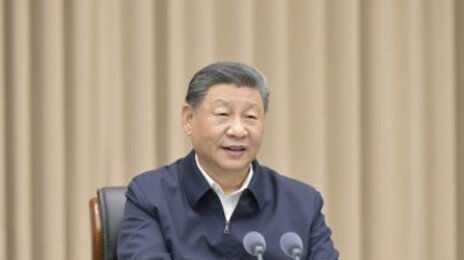저 자신이 이산가족 3세이기에, 절반은 기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절반은 이산가족의 입장에서 상봉을 지켜봤습니다. 아니, ‘반반씩’이라는 말은 틀린 지도 모릅니다.
50년만에 남편과 상봉했다는 어느 할머니의 주름투성이 얼굴 위로 월북하신 외할아버지를 애써 잊으며 살아야 했던 외할머니의 얼굴이 어쩔 수 없이 겹쳐지고, 귀에 익은 ‘니북’ 사투리 틈에서는 “내 생전에 피양땅을 또 밟을 수 있간…” 하시던 친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으니까요.
일분 일초가 흐르는 것이 미치도록 안타까운 상봉 가족들에게 TV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대며 ‘잔인하게’ 소감을 묻던 동업자인 기자들에게 저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었던 것을 보면, 어쩌면 지난 며칠만큼은 저는 ‘기자’ 보다는 ‘이산가족’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오빠를 만날 꿈에 부풀어 평양 상봉장에 나갔다가 난데없는 사망소식을 듣고 오열하는 김금자씨를 보면서 허술한 생사 확인은 이산의 고통만큼이나 큰 상처를 또다시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남북 당국자들이 아프게 느끼기를 바랍니다. 또 5명으로 제한된 인원 때문에 가족들이 출입증을 몰래 돌려가며 만나야 한다면, 과연 이는 누구를, 무엇을 위한 만남인가요.
어쩌면, 50년만에 만난 혈육들이 또다시 기약없는 이별을 해야 하는 이번 만남은 수십년동안 간신히 겉으로나마 굳어진 상처를 뜯어내 다시 피를 흘리게 하는 과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갑작스럽게 찾아왔듯 면회소 설치, 서신 교환도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빌어봅니다.
문득, 올 4월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생각납니다. 83년 KBS 이산가족찾기 생방송. 여의도 광장을 온통 흰 종이로 도배했던 그 자리엔 친할머니도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양에 두고 온 큰언니와 넷째 동생이 혹시 피란 때 내려오지 않았을까, 싶으셨나 봅니다. 가족이름이 적힌 도화지를 들고 카메라 앞에 어색하게 서 계시던 당시 할머니의 모습이 서글프게 떠오릅니다. 조금만 더 사셨더라면….
여든일곱의 김애란 할머니. 이번에 서울에 온 아들을 지척에 두고도 건강 때문에 만날 수 없자 “오래 살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오래 살아도 다 소용없어” 하고 고개를 떨구셨지요. 하지만 아들이 평양으로 출발하기 몇시간전 결국 극적으로 만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 있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50년만에 만난 아버지에게 큰절을 올리던 할아버지. 휠체어에 앉아 그 절을 받던 할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밥 한끼 지어드리고 싶다던 할머니, 딸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던 그 할머니의 어머니. 모두 모두 몸 건강히 오래 사세요. 제발 살아만 주세요.
sjkang@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