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許營·헌법학) 명지대 석좌 교수는 “고전적 헌법 이론에서는 ‘최고 통치권자가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행하는 정치적 결단’을 통치행위로 규정해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현재는 일부 권위주의적인 나라에서나 명맥을 유지하는 이론이다”고 말했다. 문 내정자는 기자들에게 “법학 통론에도 다 나오는 얘기다”라고 주장했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93년 당시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 발동한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헌법적인 심사의 대상이라며 통치행위 이론을 배척한 바 있다(헌재결 1996. 2. 29. 93헌마 186).
허 교수는 “현대 상선의 대북지원 배경과 상관없이 만일 4000억원을 건네는 과정에서 정부가 현대 상선에 직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고 이로 인해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를 적법한 통치행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일수(金日秀·법학) 고려대 교수는 “4000억원의 대북지원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것이 순수한 통치행위인지, 아니면 정권의 안정을 위한 불법행위인지도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가 통치행위 운운하는 것은 지나쳤다”며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뛰어넘어 인정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윤영철(尹永哲) 헌재소장은 헌재 창설 14주년 기념사에서 “통치행위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영란(李榮蘭·법학) 숙명여대 교수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할 수 있지만 아직 의혹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치행위라고 전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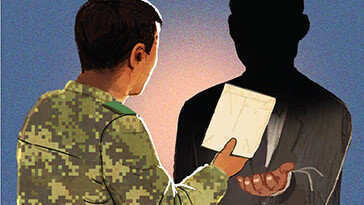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