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검찰 수사팀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나라종금 대주주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했다가 그가 진술을 번복하는 바람에 기초적인 금품 전달 사실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잘못을 자초했다.
2차 수사에서도 김 전 회장, 안 부소장, 염 위원의 진술에만 의존했다가는 또다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수사팀의 판단인 셈.
특히 안 부소장과 염 위원이 마치 말을 맞추기라도 한 듯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만일 ‘해명성 수사’를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해버리면 특별검사의 재수사라는 치욕스러운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것.
김 전 회장 계좌를 추적하기로 한 것도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에 대해 일단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계좌추적은 안 부소장과 염 위원의 나라종금 관련 비리뿐만 아니라 이들의 개인비리와 김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등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을 두고 여러 실세정치인들까지 연루된 ‘나라종금 게이트’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안 부소장과 염 위원에게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을 전달했던 1999년 당시 나라종금은 급박한 상황이어서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관측이다.
물론 김 전 회장측은 평소의 친분 때문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 인사 2명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나라종금은 안 부소장에게 2억원을 전달하기 두 달 전인 99년 4월 예금 인출 사태를 맞았다. 당시 예금 인출 사태는 대한종금의 영업정지로 비롯됐으며 나라종금은 이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대우증권으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콜자금(금융기관간 단기자금)을 지원받았다.
염 위원에게 5000만원이 전달되던 99년 8월에는 대우그룹마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부도 사태에 몰렸고 나라종금도 2차 예금 인출 위기를 맞았던 시점이다.
그러나 안 부소장과 염 위원의 위상으로 미뤄 볼 때 이들이 로비의 직접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수사경험이 많은 법조계 인사들은 말한다.
당시 안 부소장은 노 대통령이 설립한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생수 판매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안 부소장에게 돈이 전달된 99년 6월은 노 대통령이 서울 종로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된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시점이며 염 위원은 동교동계 인사로 분류돼 여권 핵심실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게 한나라당측의 주장이다.
결국 검찰은 두 사람이 받은 돈의 사용처와 성격 등을 규명한 뒤 돈의 대가성 여부를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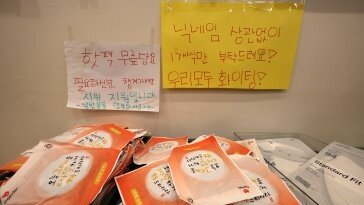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