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욱 큰 문제는 여권의 난맥상이다. 국정 경험이 없는 각료와 참모들은 “배우면 다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다. 그러나 정책의 비용-효과에 대한 정교한 계산 없이 ‘헛발길질’식 정책을 내놓기 일쑤다. 여당 내의 강경좌파 그룹은 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에 반기를 들며 ‘과감한 개혁’을 요구한다. 여권 내 핵심멤버들이 ‘동지적 관계’였던 탓에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는 식의 영(令)이 안 서는 상황도 심심치 않다.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이 반발하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이 떨어져 나가는 딜레마에 빠지자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핵심참모 회의에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지지층의 기대를 충족시킬 재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대통령짓 못해 먹겠다’는 고백이다.
우리 ‘참여정부’의 얘기가 아니다.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이 전하는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실바 대통령(59)이 겪는 고경(苦境)이다. 빈민 출신으로 노동당(PT)을 이끌고 당선된 그는 지난해 1월 취임 후 실용주의를 앞세워 경제회생에 나서 관심과 찬사를 모았다. 그러나 룰라 정부의 최근 딜레마를 외신들은 한마디로 ‘정체성의 위기’로 진단한다.
지구의 정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의 상황이 우리와 ‘닮은 꼴’이란 점에서 사람 사는 이치는 같다는 것을 새삼 절감한다.
탄핵정국에서 복귀할 때만 해도 “경제에 문제 없다”고 공언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왜 경제가 어렵고 기업투자가 부진하냐”며 참모들을 채근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무리 시장 친화적 정책을 강조해도 경제상황이 쉽게 호전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정부 여당이 내보내는 혼란스러운 메시지 때문이다. 경제는 예측가능성을 먹고 크는 생물(生物)이다.
특히 최근 주요 국정 현안을 둘러싼 여권 내의 이견은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느낌이다. 경제부총리는 ‘성장우선’을 얘기하는데 청와대 핵심참모는 ‘개혁선도론’을 주장한다.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얘기하면 당내 진보세력은 ‘선명개혁론’으로 맞선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이라크 파병문제, 의문사위의 ‘남파간첩’ 민주화기여 인정 등 거의 모든 현안이 이념대립 구도 속에 빠져 있다.
다시 브라질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외신들이 내리는 처방은 ‘이념을 포기했으면 재빨리 새로운 노선을 채택하라’는 것이다. ‘두 마리의 토끼’는 쫓을 수 없다는 얘기다.
노 대통령의 측근들은 혹시 여권의 최근 난맥상을 ‘분권화, 다원화의 특징’이라고 강변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왼쪽 깜빡이등을 켜고 우회전하는 모습’으로는 국내, 국외 어느 쪽에도 신뢰를 줄 수 없다는 점이다. ‘개혁’이든 ‘성장’이든 한 마리의 토끼를 전력을 다해 쫓기에도 남은 3년반은 길지 않다.
이동관 정치부장 dklee@donga.com
광화문에서 >
-

사설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동아경제가 만난 사람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김현수]철강 배터리 반도체 흔들… ‘슈퍼 디바이드’가 두렵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2/03/130562503.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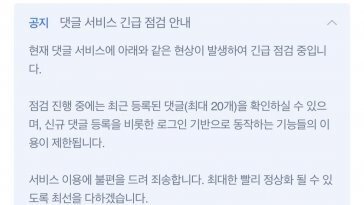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