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로서도 더 이상 묘안을 찾기 어려웠다. 이미 여론재판이 끝난 상황에서 이 전 부총리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사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여러 의혹들에 대해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명백하게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국세청이 사후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만약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이 전 부총리는 여론재판으로 수십 년간 쌓아온 명예에 치명상을 입은 셈이 된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해진 규범과 원칙에 따라 공직자의 도덕성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국민정서법’이 우선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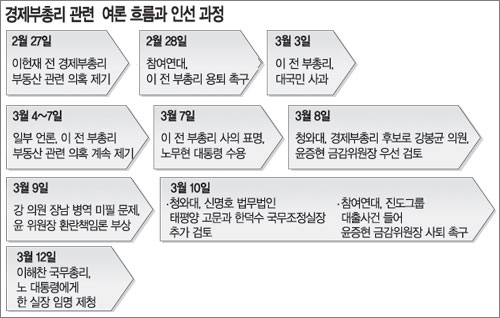 |
유효일(劉孝一) 국방차관 역시 이미 알려져 있던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 대대장 경력을 최근 시민단체들이 문제 삼고 나서면서 국방부로부터 과거 행적을 재조사받는 곤욕을 치렀다.
청와대가 이 전 부총리의 후임 인선과정에서 4명의 후보자를 사실상 공개한 것도 ‘사전 여론 검증’ 명목이었지만, 후보자들의 결점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과연 누가 적임자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약점이 없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본말 전도 현상이 빚어졌다.
1월 초 이기준(李基俊) 전 교육부총리 인사 파동으로 된서리를 맞았던 청와대는 고육책으로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후보자부터 주요 공직후보자를 공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다. 심지어 ‘청와대가 인사 포비아(phobia·공포증)에 걸려 있다’거나 ‘대한민국의 공직은 신(神)만이 맡을 수 있다’는 말까지 퍼지고 있다.
자칫하면 공직기피 현상을 초래해 인재고갈 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게 인사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청와대도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선 매우 고심하고 있는 듯하다. 김완기(金完基)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14일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좋은 인재를 활용하지 못하면 국가적으로 비극”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검증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법률고문이 검증작업을 전담하면서 공직후보자 1명에 대해 평균 3개월에 걸친 ‘현미경’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검증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검증의 공신력을 높이는 길만이 ‘여론재판’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횡설수설/김승련]윤석열 대통령 ‘가짜 출근 쇼’까지 했나](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625234.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