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긴밀한 팀워크는 50년간 동맹을 유지한 국가 간의 우정, 그리고 미국 측에서 신세를 톡톡히 진 이라크 파병으로 결실을 본 양국의 협력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결속은 현실에서 유익한 협상 결과를 얻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북한은 6자회담 참가국, 그중에서도 특히 한미 간에 정책 차이가 노출될 때마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북한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 독트린을 문제 삼은 것이 좋은 예다. 북한은 한미 양국이 한목소리를 내면 자신들을 압박하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한미 간에 갈등이 생기면 북한은 늘 시간을 끌었고,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내세웠으며, 비타협적으로 나왔다.
이런 이유에서 워싱턴과 서울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놓고 동일한 시각을 갖는 것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는 같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다른 나라처럼 북한에도 핵 이용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적어도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외적으로 폐쇄적이고, 자국민에게 폭압적이며, 핵확산금지조약(NPT)-한반도 비핵화 선언-제네바 합의를 한꺼번에 위반한 북한에 당분간 그런 권리를 줄 수 없다고 말한다. 북한이 언제라도 핵발전 기술을 무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양은 국제사회와의 세 가지 약속을 2002년 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추방할 때 명백히 어겼다. 부시 행정부는 실제로는 이보다 앞선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시점부터 위반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적어도 평화적 핵 이용권 제한에 관해서는 부시 행정부가 옳다고 본다. 북한에도 NPT가 회원국에 부여하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 이는 독재국가라 해서 거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은 NPT를 무력화한 당사자다. 어떻게 NPT를 무시하는 한편으로 그 조약에 근거해 핵 이용권을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상식적으로 한 국가가 주요 국제조약을 어겼다면, 조약의 권리를 100% 주장하기에 앞서 신뢰 회복에 주력하는 것이 순서다.
전략적으로 따져 봐도 결론은 마찬가지다. 북한은 오랫동안 핵개발에 관한 한 신뢰 상실 상태에 있음을 번번이 입증해 왔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민간용’으로 부르는 핵 프로그램으로 핵무기를 만들지 말고, 10년 정도 규칙을 지키며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
이런 합의는 어떨까. 한미 양국이 북한에 이론상으로는 마땅히 평화적 핵 개발권이 주어진다고 밝혀 둔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에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의 처신이 마땅한 권리를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북한이 핵 포기를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순간으로부터 10년 동안 그 권리를 제한하자. 핵 이용권 논의는 그때 시작할 수 있다.
전 세계는 북한에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포기하고 자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고 경제를 개혁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에 핵무기 재고를 늘리고 주변국을 더욱 위협하는 수단을 주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마이클 오핸런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세계의 눈 >
-

정경아의 퇴직생활백서
구독 131
-

여주엽의 운동처방
구독 51
-

오은영의 부모마음 아이마음
구독 302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세계의눈/폴 크루그먼]‘美집값 거품’ 그린스펀의 때늦은 경고](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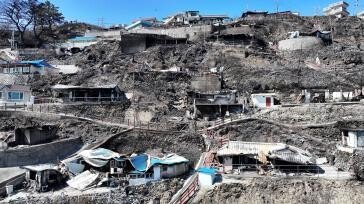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