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대북 포용정책이 6자회담 재개에 어떤 공헌을 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하지만 북-미-중 3자 간의 6자회담 재개 합의 과정에 정식으로 참여하지도 못한 한국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 때문에 6자회담이 성사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6자회담 재개 발표가 나온 지 하루가 채 안 돼 대북 포용정책의 핵심인 대북지원 재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7월 미사일 발사로 유보된 대북 쌀, 비료 지원 재개에 대해 “이는 순수 인도주의 문제이며 잠정 중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넘어서는 조치여서 정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나갈 사안”이라며 “(지원 재개 시점을) 6자회담 재개에 맞출지, 아니면 다른 요소에 맞출지 정부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북지원 재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는 발언이다. 논란이 일자 2일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 달라진 게 없다. 6자회담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으나 대북지원 문제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북한 핵실험 이후 논란이 돼 온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사업 축소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 문제도 6자회담 재개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북지원 재개 논의가 성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핵 폐기 등 실질적인 상황 개선 조치를 취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대북지원 재개부터 말하는 것은 북한에 불필요한 낙관적 신호를 보내 핵 폐기라는 본안의 해결을 오히려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6자회담 재개와는 별개로 ‘핵 폐기 시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한다’는 방침인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의 대북지원 재개는 6자회담 복귀를 통해 북한이 노리는 중요한 실익 가운데 하나”라며 “북한의 대화 재개 시늉만 보고 대북지원 재개 논의를 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협상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한국과 미국, 중국 등이 대북제재 공조를 해야 북한이 부담을 갖는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대북지원 재개에 나선다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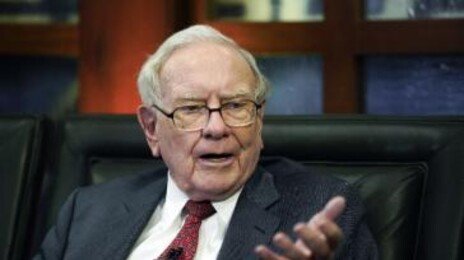
![‘사법부 저격수’로 나선 밴스…“행정부 통제 말라”[트럼피디아]](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083082.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