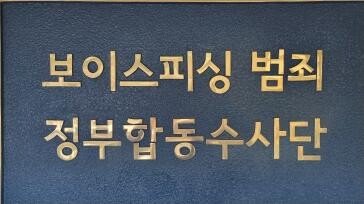최근 북한 식량난의 원인에는 국제 요인과 국내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각종 지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대규모 아사를 동반하는 위기 상황으로 발전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량 수입도 생산도 유통도 어렵다=북한 식량난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수입이 쉽지 않다. 미국 농무부 등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수입품인 옥수수의 국제시세는 단위당 2006년 88달러에서 올해 2월에는 198달러로 배 이상 올랐다.
국제 시세가 오르는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식량 소비 증가다. 중국은 국내 수요 충족과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주요 식량에 대해 수출 쿼터 및 관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을 통한 북한의 식량 수입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
여기에 미국도 2006년 북한 핵 실험 이후 대북 식량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정권이 교체된 한국은 쌀과 비료 지원을 미루고 있다. 국내 수출 원천의 고갈로 식량수입 자금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생산 부족도 심화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식량 자체 생산량은 홍수 등의 영향으로 401만 t에 그쳤으나 수요량은 650만 t이었다. 연간 부족량은 249만 t으로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다.
이 밖에 △지난해 이후 국가의 시장 활동 단속 △한국의 식량 지원 중단을 기대한 상인들의 사재기 현상 등도 식량 품귀와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식량 대체 수입국 있고 인민 내구력 늘어=일각에선 대량 아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으나, 1990년대와 같이 수십만∼수백만 명이 굶어죽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해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이라는 보고서에서 “1990년대 경제난 속에서 ‘제2경제(지하경제)’가 활성화됐다. 이것이 북한 체제가 공식 부문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최근 중국이 아닌 태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에서 식량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북한 소식통은 “함북 청진항에 식량을 실은 동남아 국가들의 화물선이 자주 들어온다”고 전했다. ▽임계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식량난이 대규모 아사를 동반하는 위기로 변화할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식량가격의 추가 상승 여부다. 꽃제비(거지) 등 사회불안 세력과 탈북자의 증가 여부도 기준이 된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후임 신선호 前차석대사 내정▼
박길연(사진)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가 다음 달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18일 “박 대사가 임기를 마치고 다음 달 평양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가 다 돼서 귀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사의 후임으로는 신선호 전 유엔 주재 차석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