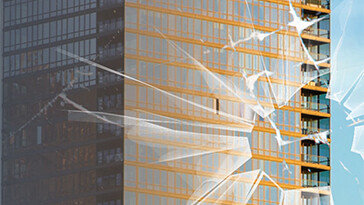《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특별강연을 했다. 지난달 26일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다음 날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등 ‘빅이벤트’를 성사시킨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의 공개 일정답게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 강연에선 날선 질문이 꽤 나왔다. 폭스뉴스 기자는 “우라늄농축과 핵 확산에 대한 신고 없이 어떻게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언론들은 대체로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힐 차관보 등 미 국무부 내 협상파가 ‘대북 강경파’에 보기 좋게 ‘한판승’을 거뒀다고 평가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게임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대북 강경파가 신고내용 검증 단계에서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 그들은 누구인가?
미국의 대북 강경파는 단일한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그룹이 아니다.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비정부기구(NGO) 등에 폭넓게 포진하고 있는 이들은 사적인 포럼이나 각종 학술회의 등을 통해 의견과 정보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의 경우 1기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만 해도 딕 체니 부통령을 정점으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존 볼턴 유엔대사,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비확산 담당 차관보 등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이제는 체니 부통령만 현직에 남아 있다.
특히 임기 말 외교적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부시 대통령이 협상파에게 힘을 실어 주면서 북핵 외교에서도 ‘부시 대통령-라이스 장관-힐 차관보’로 이어지는 ‘직보’ 체계가 확립됐으며 체니 부통령은 여기에서 소외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 내에 형성된 대북 유화정책 반대세력과 학계의 매파그룹도 대북 강경파를 이루는 주축이다.
의회에서는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 발의자인 샘 브라운백 공화당 상원의원과 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연구소에서는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위원, 데이비드 애셔 국방분석연구소(IDA) 연구위원, 래리 닉시 의회조사국(CRS) 선임연구위원도 빼놓을 수 없는 대북 강경파다.
이 밖에 NGO들은 핵 확산보다는 북한 인권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왜 그들은 강경파가 됐나?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은 대북 강경파들을 특징짓는 대목이다.
20년 이상 국방부 등에서 동북아 문제를 다뤄온 척 다운스 북한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북한은 이 정권이 끝나면 어떤 구실을 대서라도 합의를 또다시 파기하고 말 것”이라며 “새로운 행정부와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을 한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전략”이라고 말했다.
체니 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담당 부보좌관(2001∼2004년)을 지낸 스티븐 예이츠 미국외교정책협회 선임연구위원은 “체니 부통령으로선 가장 근본적인 위협은 핵 확산이며 현재 진행 중인 불능화와 바꿀 수 없는 우선순위라는 신념이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대북 강경파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담당 특사나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수전 숄티 디펜스포럼 대표 등은 인권 상황의 진전 없이 북-미관계 정상화가 진행되는 것에 맹렬하게 반대한다.
○ 대북 강경파의 미래?
대북 강경파들은 11월 대통령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보다는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선호한다.
매케인 후보는 올해 봄 외교안보 정책팀을 강성 라인으로 전면 교체했다. 대북 강경파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랜디 슈너먼 이라크해방위원회 의장과 로버트 케이건 카네기재단 수석연구위원 등 네오콘 그룹이 매케인 캠프의 외교정책팀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
애틀랜틱 카운실에서 북한연구 책임자를 지낸 스티븐 코스텔로 프로글로벌 대표는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북 강경파들의 설자리가 좁아질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8년간 쌓아 온 대북 강경파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에 대한 핵 확산과 우라늄농축 의혹 제기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주요한 이슈가 됐다”며 “북핵 검증 과정이 어렵게 진행될 경우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