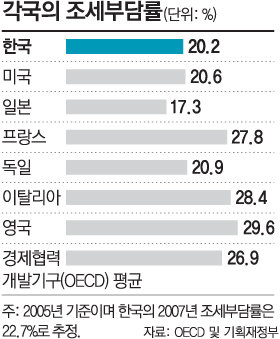
재정지출만으론 일자리 창출 한계 판단
감세후 투자-소비 안늘면 재정악화 우려도
정치권의 감세(減稅) 경쟁은 여야 모두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하고 있다.
최근 한국 경제는 대외 여건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과감한 세금 줄여주기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늘려 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치권이 내놓을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인 셈.
감세정책의 큰 목표는 비슷하지만 세부 방안에서 여야는 각각 지지층 복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책의 차별성도 확보하려는 포석을 놓고 있다.
한나라당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을 추진하고 대기업 법인세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반면, 민주당은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내리거나 전·월세 자금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는 것도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하는 대목이다.
세금이 줄면 개인과 기업이 실제 쓸 수 있는 돈, 즉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 소득 증가분만큼 개인이 소비를 늘리고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면 전체 경제의 생산 규모가 커지고 고용도 늘어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더 걷힌 세금인 세계잉여금(15조3000억 원)만큼 세금을 덜 걷었다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고 투자도 3조9000억 원 늘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현금영수증 제도의 확산 등으로 세원(稅源)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난해만이 아니라 앞으로 상당 기간 매년 7조 원 이상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감세 카드의 배경이다. 세계잉여금이 결과적으로 성장률을 깎아내리는 상황이라면 감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고유가로 인한 관세 수입과 물가 상승으로 세수가 많아져 나라살림이 늘어나는 반면 개인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한 현실도 감세가 필요한 이유다. 올해 상반기 정부 통합재정수지는 21조4000억 원 흑자였지만 올 2분기(4∼6월) 가계 실질소득은 296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감세는 일종의 경기부양책이지만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저금리 정책에 비해 정책 대상을 골라 정책효과를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반면 감세는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위험도 있다. 감세가 경기를 활성화해 세율 인하를 벌충할 만큼의 세원 확대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 총세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칫 나라 빚 증가로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되고 대외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