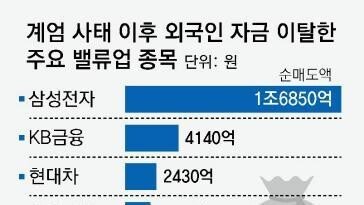그러나 앞면이 ‘성숙’이라면 뒷면은 ‘둔감’임을 정부도 국민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북이 로켓을 발사하기 직전인 3, 4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이 높다’(30.1%)는 응답이 ‘낮다’(62.5%)의 절반도 안 된다. 다수 국민이 ‘안보 불감증’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랜 세월 북의 도발이 거듭되면서 국민 사이에 내성(耐性)이 생긴 측면도 있지만 정치가 이를 부추겼다.
2006년 10월 9일 북이 핵실험을 했을 때도 우리 사회에는 큰 동요가 없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우수하고 성숙한 국민이라는 자신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화해와 협력 분위기로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핵실험이 일어났다면 국민이 얼마나 불안해하겠나”라는 논평도 했다. 이는 인과(因果)에 대한 무책임한 왜곡이다.
북 4·5 도발, 잘 대응하면 기회
전임 김대중(DJ) 정부부터 10년 동안 북에 줄 만큼 줬는데도 핵실험을 ‘당한 데’ 대해 ‘포용의 한계와 실패’를 자인했어야 정상이다. 그러면서 국제적 대북 제재 공조와는 별개로 중장기적인 군사안보정책을 수정 보강하는 계기로 삼았어야 했다. 하지만 노 정권은 거꾸로 갔다. 2012년 4월 17일을 기점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단독행사)하고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기로 미국과 합의해버렸다. 북이 핵실험을 강행한 지 4개월 뒤인 2007년 2월의 일이다.
이에 앞서 2006년 7월 북이 대포동 2호를 비롯한 미사일 7기를 발사했을 때도 노 정권은 강 건너 불 보듯 하면서 오히려 언론과 일본의 대응이 과잉이라고 화를 냈다. 노 대통령은 발사 후 6일 만에야 입을 열었다. 그는 그 후에도 “북의 미사일 발사로 미국이 가장 큰 실패를 했다”며 미국을 자극한 이종석 당시 통일부 장관을 두둔하기에 바빴다.
노 정권이 미일과의 공조를 하찮게 여기고 한미연합 체제의 와해까지 예고하면서 김정일 집단에 미소 지은 대가가 어처구니없게도 4·5 로켓 시위다. 북의 도발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탓이라고 강변하려면 DJ-노무현 정권 때 북이 저지른 미사일 발사(1998년, 2006년), 서해 무력도발(1999년, 2002년), 핵실험(2006년)에 대해서는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요컨대 김정일 집단은 주민들이 굶어죽건 말건, 남이 햇볕정책을 쓰건 말건 하고 싶은 대로 해왔다. 이에 대한 진정으로 성숙한 대응은 국민이 사재기를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최악의 상태까지 염두에 둔 안보태세 구축이다.
사실상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인 이번 도발이 기술적으로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북은 미사일 사거리 향상을 보여주었다. 핵보유국 지위의 기정사실화와 미사일 능력 향상이 맞물려 우리가 직면할 안보 위협이 현저하게 커졌다. 남북 간 미사일 격차가 허용 한계를 넘어선 것은 치명적 위협이다. 우리도 7월 한국형로켓(KSLV)을 발사할 계획이지만 사실상 러시아 로켓이다.
이 정부는 북의 도발을 국내 군사안보체제 보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여건이 많이 좋아진 한미공조를 더욱 확고히 다져야 한다. 김정일 정권은 한미일과의 협상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의 삶은 내팽개친 채 핵과 미사일 능력을 높이고 과시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민족끼리’는 철저한 위장전술일 뿐이다. 이런 정권을 비호하는 남한 내 세력의 실체도 분명해지고 있다. 유엔에서의 대북 제재 논의는 불투명하지만, 우리로서는 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제한한 한미 미사일협정 개정을 위한 전략적 협상의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한미, 對北양보 타성 이번엔 깨야
지금이야말로 북이 저지르면 한미가 결국 떡을 줘왔던 종래의 공식을 변화시킬 때다. 한미 정부는 북의 벼랑 끝 전술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부터 날려 보내야 한다. 양국의 이른바 전문가 집단도 그런 도식(圖式)이 불변인 것처럼 체념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역사는 관성과 타성을 깰 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 그리고 걸맞은 행동을 통해 바꿀 수 있다. 이를 입증하는 것도 역사다.
배인준 논설주간 injoon@donga.com
영화 >
-

한규섭 칼럼
구독
-

Tech&
구독
-

정일천의 정보전과 스파이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