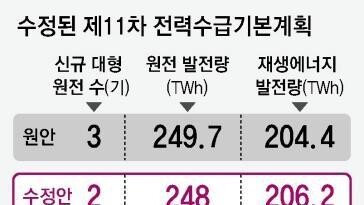“큰 지도자를 잃었다” 李대통령, 깊은 애도
한국 현대정치사의 핵심 주역으로 제15대 대통령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이 18일 85세를 일기로 서거했다.
지난달 13일 폐렴으로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김 전 대통령은 폐렴에 따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폐혈관이 혈전으로 막히는 폐색전증 등으로 인해 인공호흡기로 산소 공급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오후 1시 43분 숨졌다.
박창일 연세대 의료원장은 “폐렴으로 입원했지만 마지막에는 신장 심장 등의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인해 심장이 멎었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폐색전증 등을 이겨내지 못했다”면서 “고령인 데다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생명연장 가능성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전 대통령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유족을 대신해 정부 측과 장례 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다. 국장(國葬) 또는 국민장(國民葬) 중 어떤 형식으로 장례를 치를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큰 정치 지도자를 잃었다”며 “민주화와 민족화해를 향한 고인의 열망과 업적은 국민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애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 전 대통령 생전의 뜻이 남북화해와 국민통합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추도했다.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논평을 내고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했다.
김 전 대통령의 일생은 그 자체가 굴곡진 한국 정치의 축소판이었다.
그는 박정희 정권에서 신군부 정권에 이르는 동안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른바 동교동계와 상도동계라는 정파를 형성하며 민주화 세력의 양대 산맥을 이뤘다. 독재에 맞서 싸우다 몇 차례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넘겼다. 일본 망명 중이던 1973년 8월에는 도쿄(東京)의 한 호텔에서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치됐다가 동해에서 수장(水葬) 직전에 구출됐다. 닷새 전인 13일은 그의 생환 36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1980년 5·17 군사쿠데타 이후에는 신군부에 의해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미국 정부의 교섭으로 가까스로 석방된 뒤 미국 망명 길에 올랐다. 이런 고난을 이겨낸 그는 종종 인동초(忍冬草)에 비유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 함께 이른바 ‘3김 시대’를 주도했다. 대통령선거에 4번째 도전한 1997년 정적 관계이던 김 전 총재와의 ‘DJP 연합’을 통해 헌정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며 정치인생의 정점을 맞이했다. 하지만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대북 유화정책을 펼치면서 김 전 총재와 결별하고 진보 정권 10년의 길을 닦았다. 김 전 대통령은 2000년 6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 등 남북화해 무드를 조성한 공로로 그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그러나 정상회담 대가로 거액의 돈을 북한에 건넸다는 ‘대북송금’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그는 퇴임 후에도 활발한 강연 활동을 펼치며 민주당 지지층의 구심점 역할을 자임해 왔지만 올 들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