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95주년][통일코리아 3년차/준비해야 하나 된다]
[받는 탈북민에서 주는 탈북민으로]<上>자원봉사로 편견을 넘다

《 미래의 통일한국에서 남북 주민이 함께 잘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탈북민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이다. 한국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시각을 만드는 데도 긴요하다. 그럼에도 탈북민을 보는 세간의 인식은 여전히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머물고 있다. 이런 고정관념이 때때로 탈북민을 ‘2등 시민’처럼 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자신의 삶을 책임질 뿐 아니라 주변 이웃을 도우며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탈북자가 늘고 있다. 동아일보는 탈북민 정착을 돕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옥임)과 함께 남북 주민이 편견 없이 동등하게 어울려 사는 모습을 살펴보고 변화하는 탈북민의
정착기를 소개한다. 》
“이거 누가 주는 겁니까?”
“탈북민들이 드리는 겁니다….”
도시락을 받으려던 노인이 문을 쾅 닫아 버렸다. 울컥했다. 눈물이 나왔다.
2012년 12월 탈북민으로 구성된 파랑새봉사단을 만들어 부산 사하구의 홀몸노인, 장애인들에게 도시락을 전해 주는 봉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때였다. 봉사단장 원정옥 씨(45)는 한참을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생활이 힘든 사람들조차 북한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부산 사하구 다대1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원 씨는 봉사활동을 시작한 뒤 꽤 오랫동안 도시락을 전해 주면서도 자신이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 2013년 어느 날, 도시락을 전할 때마다 밝은 모습으로 원 씨를 맞아 주던 한 1급 장애인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다.
‘이분도 날 쫓아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잠시.
“말투가 달라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탈북민이면 어때요. 나를 위해 찾아와 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지난달 28일 만난 원 씨는 “그때 들었던 말이 큰 깨달음을 줬다”고 했다. 집집마다 찾아가 도시락을 전하며 자신이 탈북민이라고 밝혔다. 놀랍게도 모두가 반겨 주었다.
“커피 한잔하고 가라는 분, 아버지가 실향민이라며 얘기를 걸어 오는 분, 배 하나를 주머니에 넣어 주는 분까지 있었어요.”
파랑새봉사단은 한 달에 두 번 봉사활동에 나선다. 올 2월 잠시 중단했던 봉사활동을 지난달 28일 재개했다. 이날 원 씨에게 용기를 줬던 장애인 정모 씨(59)의 집을 찾았다. 전신류머티스관절염으로 장애를 얻은 정 씨는 달걀말이 멸치 콩이 담긴 도시락을 받아 들고 환하게 웃었다. 그는 “원 씨가 처음 왔을 때는 음식 만들어 주는 도우미가 끊겼던 시점이어서 눈물을 글썽이며 받았던 생각이 난다”며 “탈북민들이 한국에 적응하기 힘들 텐데 봉사활동을 하니 참 괜찮다(좋다)”고 말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가한 탈북민 방정선 씨(74)는 “정착하면서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니 죽기 전에 나도 다른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평안북도 박천군에서 태어난 원 씨는 2008년 탈북했다. 한국에 정착해 다니던 회사에서 2012년 상사에게서 폭행을 당해 어깨를 다쳤지만 회사는 원 씨를 내쫓았다. 이때부터 원 씨는 우울증 때문에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원 씨는 새로운 일을 찾았다. 2012년 6월 다대1동 38통 통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탈북민 최초의 통장이었다. 처음에는 “할 사람이 없어 탈북민을 통장 시켰느냐”는 반대가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원 씨가 쓰레기장이나 다름없던 임대아파트 앞을 화단으로 바꾸고 고성방가와 알코올의존증 환자의 주정, 이웃 간 폭행을 대화로 해결하자 주민들도 마음을 열었다. 진심으로 주민들의 말을 들어줬더니 그들도 마음을 털어놓았다.
원 씨는 “사회에 베풀면서 사람들을 알아 가니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산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올해 사회복지 학사 학위를 받은 그는 마을공동체 개념의 사회적 기업을 꿈꾸며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 “따끈한 도시락 건넬 때마다 내 마음도 따뜻” ▼
2008년 南에 온 간호조무사 김옥화씨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일하는 나흘의 낮 생활은 남들과 사뭇 다르다. 퇴근해 집에 돌아온 뒤 제대로 쉴 틈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인근 YWCA복지관에서 홀몸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나선다. 그가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009년 어느 날이었다.
“2008년 한국에 왔습니다. 간호사 준비를 위해 공부하던 시절, 제가 살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도시락을 나르는 젊은 대학생들을 만났어요. 도시락 회사에 근무하는 줄 알았죠.”
그게 아니었다. 그들은 아파트의 홀몸노인들에게 도시락을 전해 주는 봉사를 하고 있었다. 김 씨가 “회사처럼 면접을 보고 들어가야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물었더니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자신의 정착을 도왔던 도우미들도 봉사자였다.
“아, 나도 그들처럼 남을 돕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2010년 간호조무사로 취직한 뒤 한참을 바쁘게 지내던 그는 2013년 10월부터 봉사활동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때부터 꾸준하게 홀몸노인들을 위한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를 해 오고 있다. 체력이 감당하기 힘들 때도 많다는 김 씨. ‘격무로 힘들 텐데 왜 봉사를 하느냐’고 물었다.
“냉방에서 병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의 손이 제가 건넨 따끈한 도시락으로 따뜻해질 때면 저도 같이 행복해집니다.”
부산=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준비해야 하나 된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트렌드 NOW
구독
-

이진영 칼럼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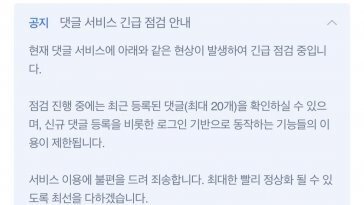

![[이진영 칼럼]도덕성 낙제점이던 대선후보 尹과 李, 지금은](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562517.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