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주위에는 일본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런 친구들 덕분에 쾌적하게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명동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사는 광화문 주변의 음식점이나 옷가게 등 점포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도 일본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많다. 내가 일본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쪽에서 먼저 일본어로 말을 걸어오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에 놀라워하자 “관광지니까 일본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뿐”이라고 지인이 말해 주었다. 그러나 일본이라면, 가령 아사쿠사(淺草)나 긴자(銀座) 같은 곳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일본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한국인이 일본어를 배우는 쪽이 발음 등의 면에서 쉽다는 것을 참작하더라도 적어도 서울에서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 같다.
내가 만난 이들 중 일본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대략 나눠 보면 ‘일 때문에 공부한 사람’ ‘만화 등 일본문화를 좋아해서 독학한 사람’ ‘식민시대에 어쩔 수 없이 익힌 사람’ 등이 있다. 식민시대에 익혔다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하는 일본어는 이해하지만 굳이 사용하려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반갑다며 유창한 일본어로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도 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일본과 가까운 나라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거리가 아니라 친밀감을 피부로 느낀다. 나는 한국에서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싫은 경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한 택시 운전사는 일본 정부에 대해 불평하기도 했으나 그 뒤에는 “하지만 일본인은 성실하고 예의 바르니까 좋아한다”고 말하며 내릴 때는 “사요나라”라고 일본어로 인사까지 해 주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일본어를 이용해 커뮤니케이션하려는 사람과 만나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일본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조금은 서글펐다. 일시 귀국했을 때 “한국사람 무섭지 않아?”라고 아는 이들이 물어올 때가 있다. 한국인이 자기 의견을 확실히 밝힌다거나 직선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 성격이 강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한편 확실히 뭔가를 말하지 않고 태도도 어중간한 일본인에 대해 뭘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한국인도 이해가 간다.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해 보면, 그리고 문화를 접해 보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도 없이 막연한 분위기나 이미지를 먼저 형성시키는 것은 아닐까.
남편의 일 관계로 8월 말에 일본으로 귀국하게 됐다. 남편도 나도 한국을 좋아하는 만큼 아쉬운 점도 많다. 한국에서의 3년 8개월 경험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관계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 칼럼을 쓰게 되면서 새삼 한국을 의식해서 바라볼 수 있었다는 점은 나에게 있어서는 매우 좋은 경험이 됐다. 내가 느낀 한국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사람 냄새나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사람들 속에서 본 것은 매뉴얼 사회인 일본에서 온 나에게 있어서는 신선한 것이었다.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되도록 피하려 하는 일본인과 비교해 한국인은 정겹고도 참견이 많으며 이야기도 잘한다. 그런 인간미 있고 따뜻한 한국인을 접하면서 한국을 좋아하게 됐다는 사람을 나는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나도 그중 한 사람이다.<끝>
가와니시 히로미
히로미의 한국 블로그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사진기자의 사談진談
구독
-

부동산 빨간펜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히로미의 한국 블로그]韓日 서로를 이해하려면…](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5/07/30/7277894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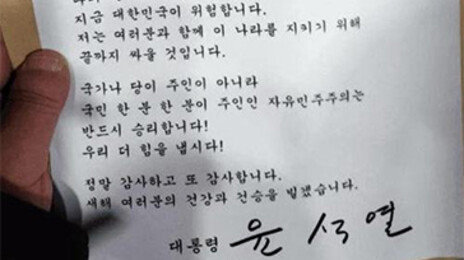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