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은 억울할지 모르겠다. 내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나, 독재를 했나, 누구처럼 외환위기를 불러오기를 했나, 그렇다고 부정축재를 했나.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개인사’를 도와준 사람에게 ‘경계의 담장’을 조금 낮추고, 일부 국정 정보를 줘 조언을 들었을 뿐인데, 하야(下野)까지 하라니….
朴만 모르는 국민의 모욕감
박근혜 대통령만 왜 국민이 이토록 분노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어느 정권에나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위임한 권력을 맘대로 가져가 국정을 농단한 비선 실세들은 있었다. 대개는 대통령의 형제나 아들 같은 가족이나 측근이었다. 이들은 결국 단죄됐고 대통령은 사과했으나 하야 위기까지 몰리진 않았다. 가족이라면 약해지는 게 한국인의 정서고, 측근이라도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브레인들이었다.
이런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들은 없었다. 배경을 입으로 옮기기도 불편한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4년을 말아먹었다니…. 국민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수치심이다. 특히 박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그보다 더한 모욕감에 무너진다.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평생 보스에게 개처럼 충성한 오른팔도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라는 한 가지 이유로 버림받지 않았던가.
대통령의 권위와 헌법적 정당성이 이 정도로 훼손됐다면 대통령으로선 하야를 고민하는 것이 순리(順理)다. 국회도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에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헌법(65조 1항) 정신에 맞다. 그러나 권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대통령과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공감대를 이룬 것이 요즘 말하는 ‘거국내각의 책임총리제’ 운영이다.
프랑스에선 의회를 장악한 야당 당수가 총리가 돼 내각을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내정(內政)을 총괄한 ‘동거(同居) 정부’가 3번 있었다. 그러나 내정과 외치(外治)가 칼로 무 자르듯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리오넬 조스팽 총리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나란히 유럽 내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웃지 못할 일은 프랑스와 경제·산업의 이해관계가 걸린 유럽 정상들이 대통령보다 총리를 만나려고 줄 섰다는 것이다.
내정과 외치 구분 되겠나
여야가 합의해 책임총리를 세우고, 그 총리가 다시 여야와 합의해 내각을 구성해 내정을 총괄하는 거국내각의 책임총리제는 프랑스에서도 시험해 본 적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사막을 걷고 있다. 거국내각 책임총리제가 신기루로 흩어질지,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험해보는 개헌의 오아시스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건 고단한 행군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권력을 감시하지 못한 언론인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다. 박 대통령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이렇다. ‘내가 이러려고 기자를 했나.’
박제균 칼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프리미엄뷰
구독
-

사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박제균의 휴먼정치]김기춘·우병우 국정농단도 규명하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6/11/17/8137468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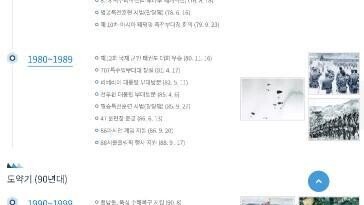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