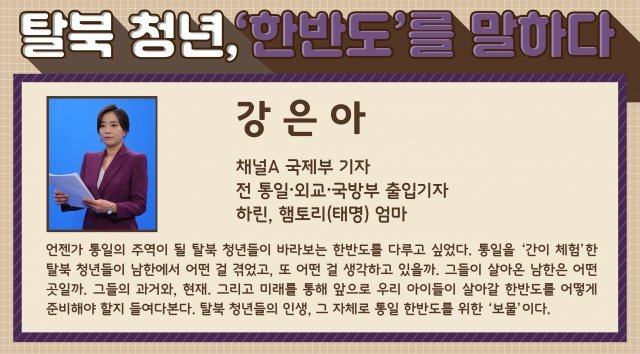
“두 번째 핵실험을 한 날 저는 학교에 있었어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학교 유리창이 다 깨졌거든요. 핵실험을 하면 정말 엄청나게 땅이 흔들려요. 주민들도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이라는 걸 다 알아요. 당국이 선전하니까요. 대피 같은 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죠.”

●‘중국행’과 ‘한국행’은 천지차이
김 씨는 14살 때부터 장마당에서 중간상인으로 일을 시작했다. 가족 모두 생업에 나서야만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열악했기 때문이었다.
“어디든 북한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이든 한국이든 잘 사는 건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학교 친구들의 3분의 1은 다 저처럼 돈벌러 나갔어요. 학교 수업을 들으러 가는 건 사치였죠. 칠보산 쪽에서 고기를 떼다 장마당에 내다 팔기도 하고, 짐을 옮겨주고 일당을 받기도 했어요. 제가 한 번 일당을 받아오면 그 돈으로 그래도 2~3일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남한 친구들이 공부하고, PC방 갈 때 북한 친구들은 다 그렇게 생업에 종사해요.”
결국 김 씨는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반 년 전쯤 엄마와 함게 북한을 탈출해 중국, 태국을 거쳐 남한으로 왔다. 처음에는 남한으로 가는지 몰랐다. 이미 외가 친척들이 탈북해서 중국에 살고 있었기에, 김 씨도 중국으로 간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앞서 탈북한 가족들 역시 남한에 정착해 있었다.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남한 행 탈북가정’으로 찍히며 특별한 감시를 당하기 때문에 흔히 있는 거짓말이었다.
김 씨는 14살 때부터 장마당에서 중간상인으로 일을 시작했다. 가족 모두 생업에 나서야만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열악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김 씨는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반 년 전쯤 엄마와 함게 북한을 탈출해 중국, 태국을 거쳐 남한으로 왔다. 처음에는 남한으로 가는지 몰랐다. 이미 외가 친척들이 탈북해서 중국에 살고 있었기에, 김 씨도 중국으로 간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앞서 탈북한 가족들 역시 남한에 정착해 있었다.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남한 행 탈북가정’으로 찍히며 특별한 감시를 당하기 때문에 흔히 있는 거짓말이었다.

●“빨갱이 새끼”… 놀림거리가 되다
2019년 현재 평범한 대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김 씨는 한국에서 태어난 여느 대학생들처럼 입시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속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창시절은 북한에서와 마찬가지도 순탄치 않았다.
북한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김 씨가 남한에 온 건 16살, 중학교 3학년 때였다. 하지만 곧장 중학교 졸업반으로 가기엔 벅차다는 판단에 중학교 2학년에 입학했다. 그때부터 힘겨운 학창시절이 시작됐다.
“북한 말투를 썼기 때문에 북한에서 온 걸 숨길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 이야기 했죠. 처음에는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거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어려서, 성숙하기 전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 빨갱이 새끼라며 막말을 던지는 친구들도 있었죠. 스트레스 엄청 받았고,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다. 학교에도, 가족에게도 꼭꼭 숨겨야했다. 얘기한다고 누가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다시 그 때 그 시절로 돌아간다 해도 어떻게 해야 할 지 아직도 모른다.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쯤 김 씨는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다. 말투도 많이 고쳐진 뒤였다. 고등학교에서는 탈북자임을 밝히지 않았다. 다행히 아무도 눈치 채지 못했다. 그래서였을까, 고등학교 시절은 재미있고 평탄했다.
●‘입시 스트레스’라는 고난의 행군
남한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단연 고3 시절 ‘입시 스트레스’를 받던 때였다. 살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겪어본 적이 없었다.
“북한에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고, 먹고 사는데 급급했죠. 하지만 남한에 온 이상 번듯하게 살고 싶다는 욕심이 강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어 북에 남아있는 가족을 만나게 됐을 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알파벳이라는 걸 접한 저에게 영어는 정말 넘기 어려운 벽이었어요. 마음먹고 진짜 단어를 죽어라 외웠어요.”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였다. 나 자신을 어필해야 한다는 그 상황 자체가 처음이었다. ‘입시’라는 단어만 들어도 괴로운 시절이었다.
“북한에서는 돈만 있으면 좋은 대학에 가요. 실력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되죠. 불법도 돈으로 다 막을 수 있어요. 불법 행위를 들키면, 돈 주면 되거든요. 하지만 전 돈이 없었어요. 북한에 있었다면 전 대학도 못 갔을 거고, 이 자리에도 없었을 겁니다.”
김 씨는 남한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라고 답했다. 하지만 입학과 동시에 아르바이트에 뛰어 들었다. 학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당장 생활비가 급했기 때문이었다.
“호텔, 식당, 편의점, 공사판,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부모님께 용돈 안 받고 제가 벌어서 제 생활은 이어나가야 했어요. 방학마다 이렇게 일해서 번 돈으로 공부도 하고, 여행도 갔어요.”
김 씨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고 말한다. 어디서든 일해야 먹고 살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
북한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김 씨가 남한에 온 건 16살, 중학교 3학년 때였다. 하지만 곧장 중학교 졸업반으로 가기엔 벅차다는 판단에 중학교 2학년에 입학했다. 그때부터 힘겨운 학창시절이 시작됐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다. 학교에도, 가족에게도 꼭꼭 숨겨야했다. 얘기한다고 누가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다시 그 때 그 시절로 돌아간다 해도 어떻게 해야 할 지 아직도 모른다.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쯤 김 씨는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다. 말투도 많이 고쳐진 뒤였다. 고등학교에서는 탈북자임을 밝히지 않았다. 다행히 아무도 눈치 채지 못했다. 그래서였을까, 고등학교 시절은 재미있고 평탄했다.
●‘입시 스트레스’라는 고난의 행군
남한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단연 고3 시절 ‘입시 스트레스’를 받던 때였다. 살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겪어본 적이 없었다.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였다. 나 자신을 어필해야 한다는 그 상황 자체가 처음이었다. ‘입시’라는 단어만 들어도 괴로운 시절이었다.
“북한에서는 돈만 있으면 좋은 대학에 가요. 실력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되죠. 불법도 돈으로 다 막을 수 있어요. 불법 행위를 들키면, 돈 주면 되거든요. 하지만 전 돈이 없었어요. 북한에 있었다면 전 대학도 못 갔을 거고, 이 자리에도 없었을 겁니다.”
김 씨는 남한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라고 답했다. 하지만 입학과 동시에 아르바이트에 뛰어 들었다. 학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당장 생활비가 급했기 때문이었다.
“호텔, 식당, 편의점, 공사판,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부모님께 용돈 안 받고 제가 벌어서 제 생활은 이어나가야 했어요. 방학마다 이렇게 일해서 번 돈으로 공부도 하고, 여행도 갔어요.”
김 씨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고 말한다. 어디서든 일해야 먹고 살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

●‘탈북자 출신’ 숨길 수 있다면 숨겨라
하지만 탈북자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은 그를 슬프게 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인력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김 씨에게 “군필자세요?”라고 묻는 전화였다. 면제라고 대답하자 “혹시 북한에서 왔어요?”라는 질문이 돌아왔다. 김 씨는 솔직하네 “네”라고 답했고, 이후 인력사무소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김 씨는 최근 하나원에서 교육받는 청년들에게 남한 정착기를 들려주고 학습을 도와주는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김 씨는 이 곳에서 만나는 학생들에게 본인이 탈북자라는 걸 밝히고 싶지 않다면, 밝히지 말라고 말한다.
“아직 남한 사회에서는 탈북자라는 걸 밝히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안 밝히는 게 덜 손해라고 생각해요. 제가 탈북자라고 밝히지 않으면, 아무도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막상 탈북자라고 말하고 나면 그 자체로 생겨나는 선입견들로 얼룩지죠.”
김 씨는 통일교육을 얘기한다. 탈북자들이 직접 청소년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선입견 없이 탈북자들을 접하고, 그들의 정착기를 듣는 것이 이런 갈등과 이질감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 취업을 하고, 본인의 생활이 안정되고 나면 그런 봉사활동을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김 씨. 하지만 아직 김 씨에겐 드높은 ‘취업 문턱’이 놓여있다.
“아직 남한 사회에서는 탈북자라는 걸 밝히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안 밝히는 게 덜 손해라고 생각해요. 제가 탈북자라고 밝히지 않으면, 아무도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막상 탈북자라고 말하고 나면 그 자체로 생겨나는 선입견들로 얼룩지죠.”
김 씨는 통일교육을 얘기한다. 탈북자들이 직접 청소년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선입견 없이 탈북자들을 접하고, 그들의 정착기를 듣는 것이 이런 갈등과 이질감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 취업을 하고, 본인의 생활이 안정되고 나면 그런 봉사활동을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김 씨. 하지만 아직 김 씨에겐 드높은 ‘취업 문턱’이 놓여있다.
강은아 채널A 기자 euna@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핵실험 날, 학교 창문이 몽땅 깨져…어디든 北서 벗어나고 싶었어요”[강은아 기자의 우아한]](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9/02/03/93965353.3.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