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韓-아세안 정상회의 초청 거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나흘 앞두고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히며 ‘찬물 끼얹기’에 나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親書) 내용과 정부의 특별사절단 파견 요청 등 물밑접촉 상황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폭로’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를 향해 “이치도 모르는 상대”라고 비난하며 공개 면박을 줬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11월 5일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김정은)께서 이번 특별수뇌자회의(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부산에 나가야 할 합당한 이유를 끝끝내 찾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상 간 비공개로 주고받은 친서 내용과 이에 대한 반응까지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은 “남측이 친서가 온 후에도 몇 차례나 국무위원장이 못 오신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내왔다”며 김 위원장의 특사 파견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두고 미국과 힘겨루기가 한창인 가운데 “남조선 당국자와는 더는 마주 앉을 이유가 없다”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을 방문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한 가운데 미국의 제재 완화를 끌어내지 못하면 비핵화 대화에서 한국의 자리는 없다는 경고를 보낸 셈이다.
김 위원장 답방이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 거물급 특사 방한을 통해 남북관계 반전은 물론 북-미 대화를 촉진하려던 문 대통령의 선순환 구상은 당분간 동력을 받기 쉽지 않게 됐다. 한미동맹에 이상 기류가 나타나는 가운데 북한도 한국에 대한 공개 면박을 이어가면서 동북아 안보지형에서 한국이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 불참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남북 정상이 모든 가능한 계기에 자주 만나 남북 사이의 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조동주 기자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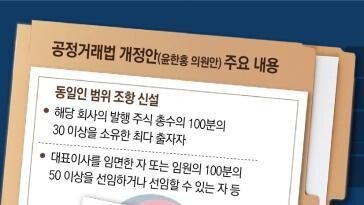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