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포인트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
기사 472
구독 179
인기 기사
-

모과차[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47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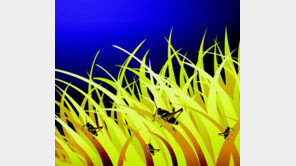
귀뚜라미[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47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골방[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47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대추 한 알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29>보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2/02/88476781.1.jpg)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29>보리
보리 ― 가람 이병기(1891∼1968) 눈 눈 싸락눈 함박눈 펑펑 쏟아지는 눈 연일 그 추위에 몹시 볶이던 보리 그 참한 포근한 속의 문득 숨을 눅여 강보에 싸인 어린애마냥 고이고이 자라노니 눈 눈 눈이 아니라 보리가 쏟아진다고 나는 홀로 춤을 추오 예전의 어린이들은 추워서 …
- 2018-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28>엄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1/26/88371004.1.jpg)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28>엄마
엄마 ―나기철 (1953∼ ) 아내가 집에 있다 아파트 문 열기 전 걸음이 빨라진다 어렸을 때 엄마가 있는 집에 올 때처럼 어린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는 장면은 언제나 같다. 문을 열면서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온다. 대개는 ‘엄마’라고 부르고, 상황에 따…
- 2018-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27>나무 아래 시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1/19/88240086.1.jpg)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27>나무 아래 시인
나무 아래 시인 ―최명길(1940-2014) 광야에 선 나무 한 그루 그 아래 앉은 사람 그는 시인이다. 나무는 광야의 농부 그 사람은 광야의 시인 가지 뻗어 하늘의 소리를 받들고 뿌리 내려 땅의 소리를 알아채는 나무 그런 나무 아래서 우주를 듣는 그런 사람 그 또한 시인이다. …
- 2018-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26>백설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1/12/88135633.1.jpg)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26>백설부
백설부 ―김동명(1900∼1968) 눈이 나린다 눈이 날린다 눈이 쌓인다 눈 속에 태고가 있다 눈 속에 오막살이가 있다 눈 속에 내 어린 시절이 있다 눈을 맞으며 길을 걷고 싶다 눈을 맞으며 날이 저물고 싶다 눈을 털며 주막에 들고 싶다 눈같이 흰 마음을 생각한다 눈같이 찬 님…
- 2018-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25>평안을 위하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1/05/88034006.1.jpg)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25>평안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김남조(1927∼)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포레의 레퀴엠을 들으면 햇빛에도 눈물난다 있는 자식 다 데리고 얼음벌판에 앉아 있는 겨울 햇빛 오오 연민하올 어머니여 평안 있으라 그 더욱 평안 있으라 죽은 이를 위한 진혼 미사곡에 산 이의 추위도 불쬐어 뎁히노니 진실로…
- 2018-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24>고고(孤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2/29/87945614.4.jpg)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24>고고(孤高)
고고(孤高) ― 김종길(1926∼2017)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옅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깵 신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래도 왼 산을 뒤…
- 2017-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23>그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2/22/87863084.1.jpg)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23>그대
그대 ―정두리(1947∼ ) 우리는 누구입니까. 빈 언덕의 자운영꽃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반짝이는 조약돌 이름을 얻지 못한 구석진 마을의 투명한 시냇물 일제히 흰 띠를 두르고 다가오는 첫눈입니다 (…) 우리는 어떤 노래입니까. 이노리나무 정수리에 낭낭 걸린 노래 한 소절 아름…
- 2017-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22>아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2/15/87741339.1.jpg)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22>아비
아비 ―오봉옥(1961∼ ) 연탄장수 울 아비 국화빵 한 무더기 가슴에 품고 행여 식을까봐 월산동 까치고개 숨차게 넘었나니 어린 자식 생각나 걷고 뛰고 넘었나니 오늘은 내가 삼십 년 전 울 아비 되어 햄버거 하나 달랑 들고도 마음부터 급하구나 허이 그 녀석 잠이 안 들었는지. 우리…
- 2017-1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21>십계(十戒)](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2/08/87637182.1.jpg)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21>십계(十戒)
십계(十戒) ― 박두진(1916∼1998) 거기서 너 서 있는 채로 떠내려가지 말아라. 거기서 너 서 있는 채로 무너지지 말아라. 거기서 너 서 있는 채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거기서 너 서 있는 채로 눈물 흘리지 말아라. 거기서 너 서 있는 채로 너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네가 가진 …
- 2017-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20>노신(魯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2/01/87533955.1.jpg)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20>노신(魯迅)
노신(魯迅) ―김광균(1914∼1993)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먼 기적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 것의 베개맡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항시 곤두박질해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
- 2017-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19>바람 부는 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1/24/87431220.1.jpg)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19>바람 부는 날
바람 부는 날 ― 박성룡(1934∼2002) 오늘 따라 바람이 저렇게 쉴 새 없이 설레고만 있음은 오늘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여의고만 있음을 바람도 나와 함께 안다는 말일까. 풀잎에 나뭇가지에 들길에 마을에 가을날 잎들이 말갛게 쓸리듯이 나는 오늘 그렇게 내게 있는 모든 것…
- 2017-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18>호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1/17/87305639.1.jpg)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18>호박
호박 ― 이승희(1965∼ ) 엎드려 있었다지, 온 생애를 그렇게 단풍 차린 잎들이 떨어지며 는실난실 휘감겨와도 그 잎들 밤새 뒤척이며 속삭였건만 마른풀들 서로 몸 비비며 바람 속으로 함께 가자 하여도 제 그림자만 꾹 움켜잡고 엎드려만 있었다지. 설움도 외로움도 오래되면 둥글어지는…
- 2017-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17> 벼랑 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1/10/87196773.1.jpg)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17> 벼랑 끝
벼랑 끝 ― 조정권(1949∼2017) 그대 보고 싶은 마음 죽이려고 산골로 찾아갔더니, 때 아닌 단풍 같은 눈만 한없이 내려 마음속 캄캄한 자물쇠로 점점 더 한밤중을 느꼈습니다. 벼랑 끝만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가다가 꽃을 만나면 마음은 꽃망울 속으로 가라앉아 재와 함께 섞이고, …
- 2017-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16>봉숭아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1/03/87091688.1.jpg)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16>봉숭아꽃
봉숭아꽃 ―민영(1934∼ ) 내 나이 오십이 되기까지 어머니는 내 새끼손가락에 봉숭아를 들여주셨다. 꽃보다 붉은 그 노을이 아들 몸에 지필지도 모르는 사악한 것을 물리쳐준다고 봉숭아물을 들여주셨다. 봉숭아야 봉숭아야, 장마 그치고 울타리 밑에 초롱불 밝힌 봉숭아야! 무덤에 누…
- 2017-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15>차부에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0/27/86978192.1.jpg)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15>차부에서
차부에서 ― 이시영(1949∼ ) 중학교 일학년 때였다. 차부(車部)에서였다. 책상 위의 잉크병을 엎질러 머 리를 짧게 올려친 젊은 매표원한테 거친 큰소리 로 야단을 맞고 있었는데 누가 곰 같은 큰손으로 다가와 가만히 어깨를 짚 었다. 아버지였다. 예전에는 많은 관계가 지금보다 …
- 2017-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