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포인트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
기사 473
구독 182
인기 기사
-

나는 그 저녁에 대해[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47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모과차[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47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다정도 병인 양[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4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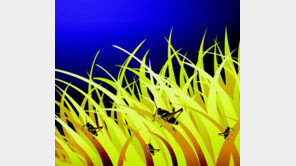
귀뚜라미[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47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별들은 따뜻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12/02/81630120.1.jpg)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별들은 따뜻하다
별들은 따뜻하다 ―정호승(1950∼ ) 하늘에는 눈이 있다 두려워할 것은 없다 캄캄한 겨울 눈 내린 보리밭길을 걸어가다가 새벽이 지나지 않고 밤이 올 때 내 가난의 하늘 위로 떠오른 별들은 따뜻하다 나에게 진리의 때는 이미 늦었으나 내가 용서라고 부르던 것들은 모두 거짓이었으나 북…
- 2016-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밥상 앞에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11/25/81513936.1.jpg)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밥상 앞에서
밥상 앞에서 ―박목월(1916∼1978) 나는 우리 신규가 젤 예뻐. 아암, 문규도 예쁘지. 밥 많이 먹는 애가 아버진 젤 예뻐. 낼은 아빠 돈 벌어가지고 이만큼 선물을 사갖고 오마. 이만큼 벌린 팔에 한 아름 비가 변한 눈 오는 공간. 무슨 짓으로 돈을 벌까. 그것은 내일에 걱정…
- 2016-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풍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11/18/81398629.1.jpg)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풍경
풍경 ― 김제현(1939∼ ) 뎅그렁 바람따라 풍경이 웁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일 뿐, 아무도 그 마음 속 깊은 적막을 알지 못합니다. 만등(卍燈)이 꺼진 산에 풍경이 웁니다. 비어서 오히려 넘치는 무상(無上)의 별빛. 아, 쇠도 혼자서 우는 아픔이 있나 …
- 2016-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고운 심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11/11/81276904.1.jpg)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고운 심장
고운 심장 ― 신석정(1907∼1974) 별도 하늘도 밤도 치웁다 얼어붙은 심장 밑으로 흐르던 한 줄기 가는 어느 난류가 멈추고 지치도록 고요한 하늘에 별도 얼어붙어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정지하고 푸른 별이 모조리 떨어질지라도 그래도 서러울 리 없다는 너는 오 너는 아직 고운…
- 2016-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 시가 깃든 삶]가마귀의 노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11/04/81161923.1.jpg)
[나민애 시가 깃든 삶]가마귀의 노래
가마귀의 노래―유치환(1908∼1967) 내 오늘 병든 짐승처럼 치운 십이월의 벌판으로 호을로 나온 뜻은 스스로 비노(悲怒)하여 갈 곳 없고 나의 심사를 뉘게도 말하지 않으려 함이로다 삭풍(朔風)에 늠렬(凜烈)한 하늘 아래 가마귀떼 날아 앉은 벌은 내버린 나누어 대지는 얼고 초목은…
- 2016-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감처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10/28/81046620.1.jpg)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감처럼
감처럼―권달웅(1944∼ ) 가랑잎 더미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리고 훤한 하늘에는 감이 익었다 사랑하는 사람아 긴 날을 잎피워온 어리석은 마음이 있었다면 사랑하는 사람아 해지는 하늘에 비웃음인듯 네 마음을 걸어놓고 가거라 눈웃음인듯 내 마음을 걸어놓고 가거라 찬서리 만나 빨갛게 익…
- 2016-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파타고니아의 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10/21/80905359.1.jpg)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파타고니아의 양
세계 지도에서 파타고니아를 찾아본다. 남아메리카 중에서도 아래, 나라로는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있고 지형으로는 안데스 산맥이 있는 그곳이 파타고니아이다. 예전에 거대한 사람들이 살았다고 전해 오는 곳이며 지금은 빙하와 초원이 펼쳐져 있는 곳. 파타고니아는 우리에게 그다지도 낯선 지명이지…
- 2016-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사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10/14/80786489.1.jpg)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사랑
이 시의 제목은 ‘사랑’이지만 본문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도 시를 읽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분명, 사랑에 대한 시가 맞다. 시인이 말하기를 사랑이란 둘이 함께 걸어가는 것을 뜻한다. 그와는 반대로, 둘이 걷다가 어느새 혼자 걸어가게 되…
- 2016-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시월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10/07/80665179.1.jpg)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시월에
시월에 ― 문태준(1970∼ ) 오이는 아주 늙고 토란잎은 매우 시들었다 산밑에는노란감국화가한무더기헤죽,헤죽웃는다 웃음이 가시는 입가에 잔주름이 자글자글하다 꽃빛이 사그라들고 있다 들길을 걸어가며 한 팔이 뺨을 어루만지는 사이에도 다른 팔이 계속 위아래로 흔들리며 따라 왔다는 걸…
- 2016-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그 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09/30/80557096.1.jpg)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그 꽃
그 꽃 ― 고은(1933∼ )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그 꽃’이라는 시는 단 세 줄로 되어 있다. 어쩐지 말이 부족할 듯도 싶다. 하지만 읽고 나면 여기에 무슨 말을 더 얹어야 좋을지 찾기 어렵다. 짧지만 여운이 깊다. 오히려 짧기 때문에 생기는 장점도…
- 2016-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대추 한 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09/23/80411504.1.jpg)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대추 한 알
대추 한 알 ― 장석주(1955∼ )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 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글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
- 2016-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의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09/09/80217734.1.jpg)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의자
의자 ―이정록(1964∼ )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여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녔냐 (…)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
- 2016-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9월도 저녁이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09/02/80095722.1.jpg)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9월도 저녁이면
9월도 저녁이면 ― 강연호(1963∼ ) 9월도 저녁이면 바람은 이분쉼표로 분다 괄호 속의 숫자놀이처럼 노을도 생각이 많아 오래 머물고 하릴없이 도랑 막고 물장구치던 아이들 집 찾아 돌아가길 기다려 등불은 켜진다 9월도 저녁이면 습자지에 물감 번지듯 푸른 산그늘 골똘히 머금는 마을 …
- 2016-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아름다운 얘기를 하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08/26/79979497.1.jpg)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아름다운 얘기를 하자
아름다운 얘기를 하자 ― 노천명(1912∼1957) 아름다운 얘기를 좀 하자 별이 자꾸 우리를 보지 않느냐 닷돈짜리 왜떡을 사먹을 제도 살구꽃이 환한 마을에서 우리는 정답게 지냈다 성황당 고개를 넘으면서도 우리 서로 의지하면 든든했다 하필 옛날이 그리울 것이냐만 늬 안에도 내 속…
- 2016-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아들에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08/19/79849808.1.jpg)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아들에게
아들에게 ― 문정희(1947∼ ) 아들아 너와 나 사이에는 신이 한 분 살고 계시나보다. 왜 나는 너를 부를 때마다 이토록 간절해지는 것이며 네 뒷모습에 대고 언제나 기도를 하는 것일까? 네가 어렸을 땐 우리 사이에 다만 아주 조그맣고 어리신 신이 계셔서 (…) 이젠 쳐다보기만 …
- 2016-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