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동료가 ‘그럼, 안녕히 가세요!’하고 환자의 귀에 대고 외치는 그 인사말이 어찌나 눈물겹고 절실했던지 결코 잊을 수 없다. 그 후로 친지들의 부음을 접할 적마다 나는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란 인사말을 고인에게 나직이 건네 보곤 한다.
신앙심이 깊은 이들에게도 죽음이란 ‘평화롭고 초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론의 이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죽음을 의식하는 연습이라도 미리 해 두어야 삶의 마무리를 잘 하지 않을까 싶다. 매일 매 순간을 ‘마지막인 듯이 새롭게’ 살아가는 연습, 모르는 이들의 죽음도 깊이 애도하며 그 슬픔에 동참하는 연습, 삶의 유한성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이기심과 탐욕을 줄여 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타인의 죽음은 어떤 사람의 명강론이나 어떤 책의 명언보다도 힘있는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디게 닫혀서 듣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다.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에 탔던 7명 중 한 여성이 죽기 전 했던 ‘지구가 참으로 아름답다’는 말을 기억하던 날, 나는 밤새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다.
며칠 전 일어난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사고로 가족을 잃은 이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웃의 갑작스러운 비극이나 불행을 대할 때 ‘그들이 바로 나 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사별의 슬픔을 겪은 이들과 그 쓰라림을 나누며 작은 위로라도 건네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의무임을 다시 깨닫자.
‘주님, 자비로이 이 밤을 비추어주시고, 밝아 오는 아침에 당신 이름으로 일어나 건강한 몸과 기쁜 마음으로 새날 빛을 볼 수 있도록 오늘 평화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하루 일과의 ‘끝 기도’에서 늘 습관적으로만 외우던 기도 내용을 다시 묵상하며 나는 새 아침을 기다린다.
이해인 수녀·시인
사랑과 자비 >
-

김도연 칼럼
구독
-

사설
구독
-

이은화의 미술시간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랑과 자비]神話에 대한 다섯가지 사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3/03/07/6888365.1.jpg)
![[사설]권위주의로 퇴행 기도한 尹, 뭘 하려고 했나](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725100.1.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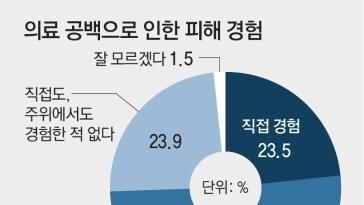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