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등의 홈페이지에는 당장 ‘영화 황산벌 촬영의 70%가 부여인데…전라도 사투리라니?.’ ‘부여 군수는 낮잠을 자고 있나…황산벌이 전라도 인가.’ ‘계백장군이 호남 사투리를 쓴다?’ 등의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영화사의 말투 설정은 우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부여군 충화면(백제시대의 팔충면) 출신의 계백장군을 호남 인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전종욱’이라고 밝힌 고교생 네티즌은 “‘자네 부여 산다고 그랬나? 거기서 박중훈 나오는 영화 촬영했었지. (그런데 부여가) 전라도 어디 쯤이야?’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역사상 가장 비장한 현실을 희화화한 것도 내키지 않는다. 계백은 황산벌 전투를 앞두고 사랑하는 가족의 목을 먼저 베며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독하다고 소문난 일본의 사무라이도 감히 흉내내기 힘든 무장의 단호함이었다. 조선시대 사학자인 안정복은 이미 ‘계백을 충과 의에 관한한 역사상 가장 으뜸가는 인물’로 꼽았다.
특히 충남 부여 출신의 계백 장군이 전라도 사투리를 쓰도록 한 ‘배경’도 문제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대결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 이도학(李道學·백제사) 교수는 “아무리 영화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영호남 대결을 통해 흥행을 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화사측은 “영화는 영화 자체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며 “스토리에는 계백의 충성심 등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부여군은 영화사측에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어떤 시정 약속이나 납득할 만한 해명을 듣지 못한 채 백제 역사재현단지 인근에 세트장을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무책임한 ‘방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영화사는 ‘어줍짢은 역사해석’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진정한 ‘창작자’임을 자임한다면 이에 앞서 그 시대에 치열하게 살아온 민중의 역사를 올바로 취재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다음, 그 역사적 교훈을 희화화 하던 멜러물로 만드는 것은 영화사의 재량이다.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영화사의 자유영역이 아닌 책임영역임을 명심해야 한다.
부여=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  
|
| |
대전/충남 >
-

고양이 눈
구독 84
-

전문의 칼럼
구독
-

이은화의 미술시간
구독 179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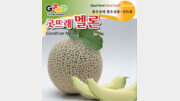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