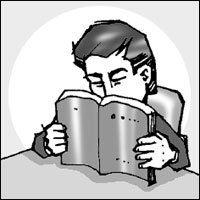
▷10대들에게 대중문화 스타에게 열광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좋다’는 대답이 돌아오기 일쑤다. 기성세대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하지만 청소년들은 좋고 싫음을 이미지 전체로 판단하고 감각적으로 대상에 접근하는 데 이미 익숙해져 있다. 어릴 적부터 영상매체에 접해 온 이들이 40, 50대가 되어 있을 즈음이면 논리와 개념 같은 사고의 기본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 팽배한 외모지상주의에서 나타나듯이 겉치레가 중시되고 인간의 내면적 가치는 무시되는 사회현상도 ‘읽는 문화’의 소외 및 ‘영상 문화’의 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이 대학 논술시험에서 고전 100권을 골라 그 안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죽 학생들이 책을 안 읽으면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책을 읽히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싶다. 문화관광부가 실시한 지난해 문화향수 실태조사에서도 영화 쪽 편식이 두드러졌다. 다른 문화 분야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한국 영화의 비약적 성장은 마땅히 축하받을 일이다. 다만 문화의 잘되는 쪽만 부각되어 그늘진 곳이 묻혀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영상 시대라는 큰 흐름은 굳건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읽는 문화’의 효용가치가 사라진 것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 인문학이 활기를 띠어야 응용 학문이 탄력을 받듯이 ‘읽는 문화’를 비롯한 각 문화 분야가 고르게 발전해야 한국 영화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영화만큼 해내지 못하는 다른 문화 종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공계의 위기는 걱정해도 인문학의 위기와 문화의 위기에는 별 관심이 없는 세태도 문제이기는 마찬가지다.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
횡설수설 >
-

데스크가 만난 사람
구독 23
-

오늘과 내일
구독
-

이주현의 경매 길라잡이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횡설수설/김승련]뺄수록 더 눈에 띄는 한동훈의 21년 검사 이력](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2/20/131075277.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