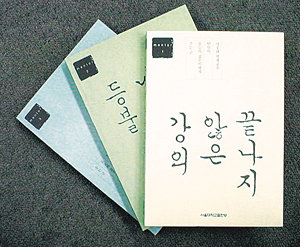
서울대 명예교수 57명의 글이 세 권의 책에 묶였다. ‘전공도 걸어 온 길도 각각이지만,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10대 초반에 광복을 맞고, 잔혹한 전쟁과 함께 대학시절을 시작하고, 혁명과 군사정변으로 세상이 뒤집히는 것을 목격하며 공부란 무엇인지, 학문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지 고뇌한’ 이들이라는 ‘책머리에’의 말(정운찬·서울대 총장)은 57인 모두에게 공통된다.
첫 권 ‘끝나지 않은 강의’에는 강의 생활 초반의 잔잔한 떨림과 각오를 회상한 글들을 모았다. 김윤식 명예교수(국문학)는 조선 사회가 ‘근대’의 싹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논증함으로써 ‘식민사관’을 극복하려 했던 60년대의 캠퍼스 분위기를 회상한다. “이런 연구 결과만큼 우리 세대 인문학도를 흥분시킨 것은 없었다… 우리 근대문학의 기점을 18세기 후반까지 끌어올리는 문학사적 구도가 짜인 것도 이런 과정의 산물이었다.”
두 번째 권 ‘내 마음의 등불’에는 잊을 수 없는 은사를 회상하는 추억담이 담겼다. 김준호 명예교수(생명과학)는 창암 이민재 선생을 ‘학문과 수신과 제가의 길로 인도하신 나의 총통’이라고 표현했다. 석사 논문을 쓸 때가 되자 스승은 달랑 약병 하나를 건네주며 논문을 쓰라고 ‘하명’했다. 결과를 정리하고 논문을 쓸 때까지 아무 말씀도 없었지만 논문이 마무리되자 철저한 교정으로 깨우침을 주었다. 엄격한 면모와 달리 때로 스페인 가곡 ‘라 팔로마’를 우렁차게 열창하던 기억도 추억으로 남아 있다.
세 번째 권 ‘다섯 수레의 책’에서 노학자들은 초년 학자시절 감동과 영향을 끼친 책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특히 눈길이 가는 부분은 김안제 명예교수(환경대학원)의 글. 서두에서부터 그는 꼼꼼한 ‘통계’로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자신이 평생 읽어 온 책 2305권을 장르와 시대에 걸쳐 도표로 정리한 것. 그런 그에게 가장 큰 영향과 감명을 준 책은 뒤마의 ‘몽테 크리스토 백작’이다. 김래성 번안의 ‘진주탑’ ‘암굴왕’으로 시작해 1994년에야 제대로 된 전질을 읽었다는 노교수는 유럽 지도까지 동원해 작품의 지리적 해설에 나선다. 소설의 무대가 된 마르세유, 이프 감옥, 파리 탐방기도 곁들여진다.박세희 명예교수(수학)는 평생에 걸친 학문의 길을 ‘이루지 못한 사랑의 아쉬움’에 비유한다. “학문을 한다는 것은 아는 것의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모르는 것이 전보다 훨씬 늘어나는 것이다”라고 고백한다.
유윤종기자 gustav@donga.com
인문사회 >
-

이주현의 경매 길라잡이
구독
-

동아시론
구독
-

기고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책의 향기]“콩나물 팍팍 무쳤냐”… 국민 울고 웃긴 예능史](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2/10/88603498.1.jpg)


![[횡설수설/신광영]남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 합성하면 모욕죄](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80156.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