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데 어째 거리 풍경이 수상하다. 서울시청 앞을 지나든, 중심가의 백화점 거리를 지나든 불빛은 휘황하기만 한데 그 불빛 속을 지나는 이들의 모습은 왠지 스산하기만 하다.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걸음을 재촉하는 품이 갑자기 들이닥친 추위 탓만은 아닌 듯하다. 마침 택시 운전사도 한몫 거드는 것이 “손님, 요즘 택시 잡기 정말 쉬우시죠. 우리 같은 운전사가 하루 10만 원을 집에 가져가려면 몇 시간 일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무려 17시간을 꼬박 택시를 몰아야 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때도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다는 후렴을 덧붙였다.
▼화려한 조명아래 움츠린 행인▼
올 한 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경기 불황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국민을 향해 희망적 메시지 보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언론들이 비관적 정보를 유포하여 소비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킴으로써 잘나가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강한 불만과 질타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가.
한데 서민들 입장에서 체감한 올해 경기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을 것 같다. 수출은 단군 이래 최고라는데 신용카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고, 아버지의 고용불안도 서럽기만 한데 아들딸까지 청년실업에 시달리는 현실이고 보니 더욱 그럴 것 같다. 그나마 새해부터는 우리 정부가 경기부양 및 민생안정에 전력을 경주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니, 희망의 끈을 계속 잡긴 잡아야 할까 보다.
이제 우리도 고속 성장기를 거쳐 저속 성장 사회로 접어든 만큼, 개인적으론 누구라도 생애주기를 거치는 동안 취업의 안도감과 실업의 불안감을 오고갈 것이요, 가족이나 동네 차원에서는 개천에서 용 나는 인재를 보기는 점차 어려워질 것이고, 세대간 계층 상승의 기회 또한 지금보다 눈에 띄게 제한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삶의 불안정성에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현실의 예측 불가능성에 보호막 기능을 해주는 것이 바로 ‘복지’ 아니겠는가. 우리가 늘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서유럽의 복지국가는 국민을 향해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평생 동안 적정 수준의 의료 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며, 퇴직 후 안락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지 않는가.
이 대목에서, 국민 복지를 위해 국가가 충분한 재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해가는 경우 이를 ‘강한 국가’라 하고, 거꾸로 국민 복지를 위한 현실적 가용재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복지 마인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를 ‘약한 국가’로 분류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듯하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약한 국가’로부터 명실상부한 ‘강한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 ‘무늬만’ 복지를 표방하는 여전히 ‘약한 국가’는 아닌지.
▼인간존중의 복지정책 필요▼
어린 시절 이민자를 위한 집단 거주시설에서 성장해 후일 미국의 명문대 교수가 된 입지전적 인물인 사회심리학자 리처드 세넷의 주장에 따르면, 불평등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정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지정책이 결정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가치가 있는 바, 그건 바로 ‘인간존중(respect)’이라는 것이다. 인간존중을 저버린 정책은 나아가야 할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중요한 목적을 오히려 수단의 편의에 종속시키는 어이없는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젠 복지의 단순한 구현을 넘어 복지의 고양된 가치를 논할 수 있을 만큼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한층 진지해지고 더욱 성숙해지길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
수요프리즘 >
-

김선미의 시크릿가든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이준식의 한시 한 수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수요프리즘/권혁범]강의석, 허성혜를 생각한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4/12/28/693646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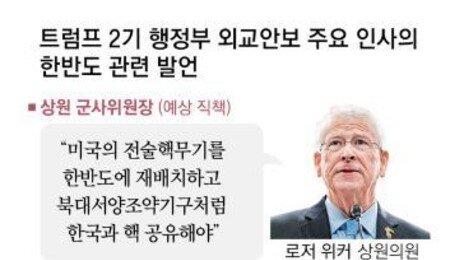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