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여배우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 기회에 ‘현대인의 감기’라 불리는 우울증에 대해 점검하고 이에 대처하자는 기사가 빈번히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아마 사회구성원의 자살 원인을 개인 내부로 돌릴수록 그 사회에서는 개인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이 배가될 것이다.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어떤 이들은 이번 기회에 스타와 대중 간의 역동성에 대해 점검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연예인의 사생활과 여배우의 노출 등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스타, 특히 여배우의 ‘사회적 의미’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담론들을 뒤로 하고 대중이 한 여배우의 죽음에 직면해 즉각적이고 아주 근본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한결같이 안타까워하고 궁금해 한다. 경제적으로도 남부러울 것 없고 엊그제 대학을 졸업한 톱스타가 왜 자살을 했느냐는 것이다.
이과 관련해 울리히 벡이라는 사회학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위험 사회’로 간주했다. 그는 부의 분배가 문제였던 산업사회와 달리 후기 산업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험’이라고 규정했다. 예를 들면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나 각종 기상이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오히려 생태학적인 위험은 높아지고, 가속화되는 개인주의 경향은 자살 같은 위험을 더욱 부추긴다는 것이다. 과거 전근대 사회에서는 ‘배고픔’이 자살을 부추겼다면, 이제는 ‘두려움’이 자살을 불러온다고 한다. 계급이나 부, 가족 등은 더 이상 개인을 지탱하는 바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누구냐’, ‘어떤 의미로 세상을 살아가느냐’라는 문제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내던져진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과거에는 고시에 떨어져 자살하는 청년, 소값 폭락으로 목숨을 끊는 농부가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다면, 지금은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고 죽음을 선택하는 초등학생이나 인기의 절정에서 목을 매는 여배우가 생겨나는 까닭을. 벡은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가 세분화할수록, 경쟁문화, 소비문화, ‘빨리빨리’ 문화가 깊어질수록 위험사회의 자살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암울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벡도 위험사회의 대안으로 ‘성찰적 근대화’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이제는 한 스타의 죽음의 원인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도 좀 더 천천히 깊이 있게 우리 사회의 ‘위험’을 들여다볼 시간이 된 것은 아닐까. 단지 그가 톱스타이고 인기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죽음도 안타깝고 미연에 방지해야한다는 것. 죽음의 심연 앞에서 한 줌의 재가 된 여배우가 지금 우리에게 던져놓고 떠난 무거운 숙제이기도 하다.
심영섭 영화평론가
문화 칼럼 >
-

이은화의 미술시간
구독
-

동아경제가 만난 사람
구독
-

경제 Inside Out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문화칼럼/최준호]‘배고픈 햄릿’은 몰입할 수 없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5/03/07/694121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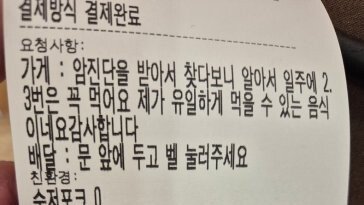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