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단 대학의 문제만은 아닌 듯싶다. 얼마 전 신문에서 고교 1학년 교실 풍경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다. 외국어고나 과학고에서 전학 온 학생이 내신 1등급을 차지한다며 소위 ‘왕따’시킨다는 내용도 있었다. 내신 경쟁의 바람이 고교 1학년 교실을 싸늘하게 만든 것이다.
경쟁은 사회를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해서 전체 수준을 상향 평준화시킨다. 다른 사람의 노력을 보면서 나 역시 열심히 하게 되고 확실히 전보다는 나은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이 보장된 사회는 계속해서 발전한다. 그러나 이 경쟁이 왜곡된다면 사회는 씻지 못할 상처를 입게 된다. 경쟁 상대가 ‘적’으로 인식되는 순간 하루하루가 숨 막히는 일상의 전쟁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과잉경쟁에 의한 소외와 박탈감이라고 한다.
 |
문학수업 시간에 배웠던 정현종의 시 ‘섬’이 떠오른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그 섬에 가고 싶다.’ 이 시에서처럼 경쟁에 지친 사람들은 서로 단절돼 홀로 떠 있는 섬이 된다. 경쟁을 하더라도 지친 상대방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넘어져서 주저앉은 친구의 어깨를 토닥거릴 수 있는 인정은 남겨두어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런 숨쉴 수 있는 공간에서의 경쟁이 더 좋은 효과를 낳을지도 모르는 것 아닐까.
박은영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4년·본보 대학생 명예기자
캠퍼스 산책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인터뷰
구독
-

사설
구독
-

글로벌 현장을 가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캠퍼스 산책]이윤경/학생을 고객처럼 대했으면…](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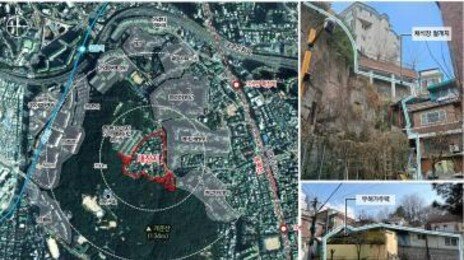


댓글 0